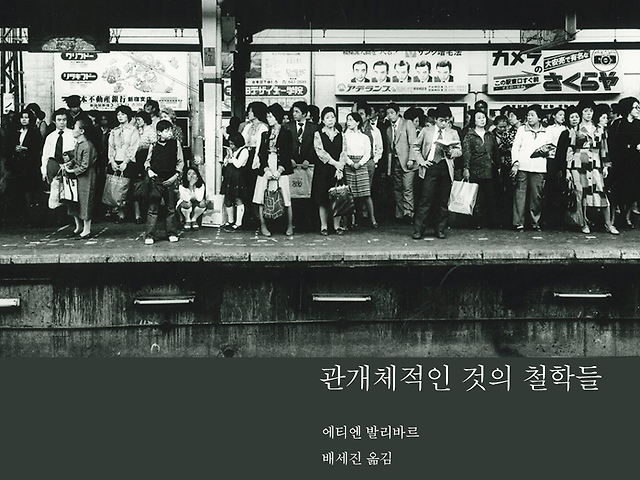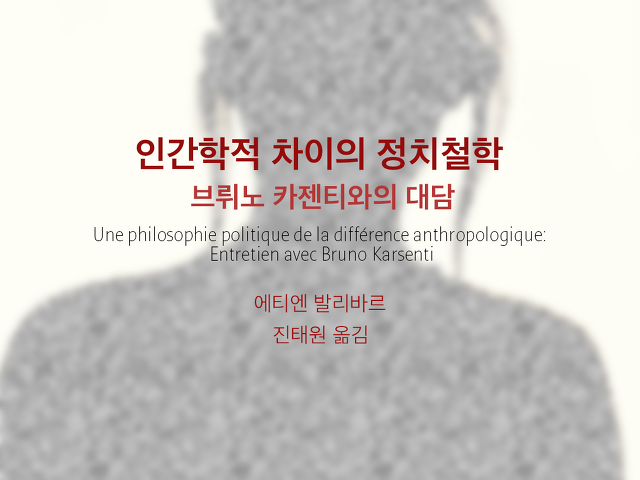말하기, 대항말하기: 푸코에게서 파레시아의 형태들에 관하여[각주:1][각주:2][각주:3]
에티엔 발리바르의 저서 “자유로운 말”(Libre parole, Galilée, 2018)의 3장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배세진 옮김
pdf로 내려받기
 발리바르-파레시아-송고용-최종본.pdf
발리바르-파레시아-송고용-최종본.pdf
(아래 붙여넣기된 판본에는 고딕체 강조표시가 오류로 인해 모두 빠져버렸으므로, 인용을 원할 경우 위 PDF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인용하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한다는 사실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요?[각주:4]
-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1971
이 자리에서 저는 파레시아에 할애된 푸코의 최후의 강의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있는 푸코의 저작이 취하는 의미와 의도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 푸코의 최후의 강의들이 가질 수 있는 [복수의] 함의들을, 소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바로 이 질문들 사이에서, 푸코의 비판 개념의 변화(évolution)가, 그리고 [현실의] 정치장 내에서의 푸코 자신의 개입을 문제화함으로써(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정교구성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말이죠 - 푸코에게서 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분산되어있으며éclaté 동질적이지 않다fuyant는 점을 우리는 꼭 지적해야 합니다) 근대 유럽 전통 내 지식인의 이미지를 전치시키기 위한 푸코의 반복된 시도들이, 나타나지요. 역사학자들과 문헌학자들이 인식해낸 여러 다른 의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소노미아(isonomia)와 이세고리아(isègoria)라는 용어들과 맺는 상보성의 관계 내에서, 파레시아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démocratie)라고 부르는 무언가(quelque chose)를 함의했습니다(반면 데모크라티아dèmokratia는, 이미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본질적으로 경멸적인 가치[의미]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더욱 축자적으로 보자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파레시아라는 용어는 ‘솔직히 말하기’(franc parler), ‘말의 자유’(liberté de parole) 혹은 ‘말의 용기’(courage de la parole)를 지시했습니다(버클리Berkeley 대학교에서 이 주제에 관해 푸코가 행했던 강연들 중 몇몇은 Fearless Speech[두려움 없는 말]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출간되었죠).[각주:5][각주:6] 명백히 이 모든 것은 정치, 비판 그리고 그 공적 차원 내에서의 지적 활동, 이 셋 사이의 매듭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몇몇 수수께끼들 또한 제시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그리스어 파레시아 -바로 이 그리스어 파레시아가 푸코의 탐구 대상을 형성하는 것인데- 의 [여러] 활용들[용례들]이 지니는 불안정성과 다양성은 이 그리스어 파레시아에 유일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특히 이 그리스어 파레시아를 우리가 일의적인 방식으로 정치적(politique)이라 부르는 그러한 영역과 관계맺도록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일 우리가 맥락의 변화들 그리고 언어 상태의 변화들과 관계된 의미론적 파생물을 기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푸코에게서 이 파레시아라는 용어가 형성하는 전체 궤적이 정치적인 것, 담론 그리고 진실 사이의 내재적 관계를 문제화하는 방식을 그려내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윤리적이고 개인적인personnelle(즉 그 용어의 현재적 의미에서 ‘주체적인’) 영역으로의 점진적 후퇴를 그려내는 것처럼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의 파레시아에 관한 주석 내에서 정치적 성격의 의도들과 가치판단들이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적 질문(questionnement)을 그리스적 장면[그리스라는 무대]으로 투사해버리기(projection) -이러한 투사는 우리 서구의 철학 문화에서 성찰의 대상들을 이상화하는 하나의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연구 방식이 현재 혹은 더 정확히 말해 현재성의 문제화를 향해 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언하는 그러한 저자인 푸코의 편에서 보면 이러한 투사는 꽤나 놀라운 것이죠[푸코 자신이 이러한 투사를 행해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어버릴[오해할] 수도 있습니다.[각주:7] 이로 인해[이러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푸코에게서 파레시아가 문헌학적이고 미학적인 -이 문헌학과 미학이라는 두 통념들이 [텍스트적] 박식함(érudition)과 독해(lecture)의 미학으로서의 푸코의 작업과 항상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고 말죠.
그렇지만 ‘최후의 저작/작업/작품’(œuvre dernière)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저자의 죽음 바로 직전의 저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유혹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우리는 푸코의 죽음이 초래하는 연민(pathétique)으로부터는 스스로를 거리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푸코의 최후의 강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관점을 푸코의 저작 전체에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목적론적 함의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 정의상, 이 푸코의 최후의 강의들은 이 최후의 강의들 이전에 존재했던 푸코의 모든 것에 대한 완성 혹은 결론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푸코의 이 최후의 강의들이 또 다른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 -하지만 [푸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결국 빛을 보지는 못하게 되는- 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다는 점을, 하지만 이 최후의 강의들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몇몇 것들을 말해야 한다는 푸코의 긴급함의 감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푸코의 이 최후의 강의들에서 언표행위의 주체는 (혹은, 푸코가 종종 그렇게 말하듯, enuntiandum 즉 ‘언표되어야만 함/언표되어야만 하는 것’devant être énoncé은), 비록 변호인(intercesseurs)의 위임에 의해 그리고 일종의 가면 아래에서 그러한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점들에서, 푸코의 이전 가르침들 속에서 그러했던 것보다 더욱 고집스레 언표 그 자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레시아에 대한 탐구 -푸코의 마지막 두 해의 가르침의 거의 전부를 흡수하게 되는- 가 푸코의 저작 전체와 교통하는 방식을 혹은 이 저작 전체를 ‘요약’(résume)하고 특정한 관점에서 이 저작의 의도들을 정식화하는 방식을 규정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무용한 작업(quête)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탐구가 지니는 미완의 그러니까 열려진 특징은 그 용어의 실정적인 의미에서 심원하게 아포리아적인 특징 -푸코의 철학적 작업이 그 전체성(totalité) 내에서 취하는 그러한 특징- 의 비유[알레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격의 성찰들을 끝맽기 위해, 저는 푸코의 저작 내에서 파레시아에 대한 질문이 취하는 탈중심적 중심성(centralité excentrique)이라 (의도적으로 모순어법적인 방식으로) 제가 부르고자 하는 바를 지시해주는 것으로 저에게 보이는(다섯 가지 관념들 모두를 함께 고려했을 때에는) 다섯 가지 관념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
첫 번째로, 파레시아라는 문제와 푸코의 사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행한다면, 파레시아라는 이름/명사가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라는 자신의 [한정된] 장소에 [국지적으로] 위치해 있는 파레시아라는 문제가 푸코의 저작에서 조숙한(précoce) 방식으로[후기 푸코 이전에 이미] 돌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진실과 법률적 형태들’에 관해 브라질 리오에서 행한 푸코의 1974년 강연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이러한 위대한 정복물,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 진실을 권력에 대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확정적인 방식으로 탄생되고 확립되었던 그러한 기나긴 과정 속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권력 없는 진실을 진실 없는 권력과 대립시킬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그리스 사회에 특징적인 거대한 일련의 문화적 형태들을 낳았습니다(…).”[각주:8] 이 구절을 푸코의 최후의 강의들과 상호접근시킴으로써, 우리는 푸코가 말년에 이 파레시아라는 질문을 드디어 발견해낸 것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파레시아라는 이름/명사가 제시하는 것들(suggestions)과 이와 연결되는 선들[실들](fils)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푸코는 이 파레시아라는 질문을 전치시키고 재정식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듯, 푸코는 권력과 진실 사이의 상호적 외부성(extériorité réciproque)이라는 도식을 [비판하면서 이를] 복잡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해에 이루어진 푸코의 강의들이 비판이라는 칸트적 통념과 칸트가 1784년의 소논문에서 제시하는 계몽(Aufklärung)에 대한 정의에 관한 해석을 다루는 두 번의 회차로 시작한다는 사실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각주:9] 심지어 이 두 번의 회차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서 푸코가 이 [비판이라는 칸트적 통념과 칸트의 계몽에 대한 정의라는] 주제에 할애한 분석들 중 가장 발전된 분석들이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칸트의 텍스트로의 푸코의 주기적 회귀는 푸코가 자신의 철학적 활동에 대해 취하는 성찰적 위치/입장(position)을, 그리고 이 철학적 활동이 현재성과 맺는 관계를, 그러니까 푸코라는 이름의 저자의 앙가주망(engagement) 혹은 정치적 개입의 역사적 계기와 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핵심적인 실(fil)을 구성하는 것입니다.[각주:10] 하지만 비판과 계몽에 관한 칸트의 논평과 파레시아에 대한 분석의 병치는 수수께끼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데, 분명히/겉보기에(apparemment) 이러한 병치는 푸코에게서 하나의 [논리적] 연쇄 혹은 하나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오는] 계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콜라주’(collage)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레시아가 근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칸트가 비판(Kritik)이라고 이후에 부르게 될 바에 대한 고대적 원형(prototype)이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할 경우, 이 파레시아의 기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원적 의미를 명료히 밝혀주는 것? 반정립적 효과를 생산하는 것? 혹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전치 -계몽주의자들의 목적들과 도구들에 대하여(par rapport aux)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동시키는 그러한 전치로의 길 위에 (간접적 효과를 통해)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전치- 를 지시하는 것? 그도 아니라면, 근대적 비판의 서로 다른 여러 양태들 대신에, 우리가 다소간 상상적인 방식으로 파레시아라는 그리스적 이상성(idéal)으로 되돌아오고자 노력해야만 한다고 제안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푸코를 따라 ‘파레시아스트’ -권력과의 갈등(conflit)과 대결(affrontement)이 초래하는 위험들과 함께[위험들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publiquement) 진실을 말하거나(dire la vérité) 참을 말하기(dire le vrai) 위해 발언을 하는 그러한 개인(이 개인이 행하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권력이 주권자의 권력이든 지도자의 권력이든 혹은 더욱 산발적diffus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의 사회와 그 규율적 혹은 규범적 메커니즘들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권력이든, 위에서 말한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 기능을 예증하는 서로 다른 여러 유형들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푸코가 이러한 언표행위의 상황을 극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각주:11] 우리는 푸코의 저작이 ‘파레시아스트들’ -폴리스(polis), 아고라(agora) 그리고 파이데이아(paideia)라는 특수하게 그리스적인 범주들이 조직하는 그러한 장면과는 다른 다수의 장면들 위에서 이리저리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essaimant)- 에 의해 항상 점유되어(peuplée)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장면마다 이 파레시아스트들의 품행, 의도 그리고 언어는 변형됩니다만, 이 파레시아스트들 전체 사이에서는 가족 유사성(air de famille)과 같은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 파레시아스트들을 파레시아적 장면으로부터 관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레시아스트적 장면에서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공통된 이름/명사를 찾고자 할 때, 그제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족 유사성 말이죠. 그리스도교 순교자들과 이단자들, 또한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정통과 이단을 분리하는 (하지만 별로 뚜렷하지는 않은) 선 위에 서있는 일종의 파레시아스트들입니다. 데카르트적 이성의 담론에 의해 부인된 진실을 말하는 광인들, 그리고 드니 디드로의 소설 “라모의 조카”와 같은 문학이 발명해낸 (이 광인들의) 이상한 이웃들(étranges voisins)은 일종의 파레시아스트들입니다.[각주:12] 19세기의 범죄자 연보의 ‘이름없는/불명예스러운 사람들’(hommes infâmes) -이 ‘이름없는/불명예스러운’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와 그 어원을 가지고 말놀이를 하면서 푸코 자신이 이들을 이렇게 명명하죠-, 특히 ‘일반인의’(ordinaire) 담론에서조차 진실과 죽음 사이의 심원한 관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경탄스런 인물 피에르 리비에르(Pierre Rivière)는 (푸코가 이들의 ‘삶들’을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그 어둠으로부터 꺼내주기를 꿈꿨던) 분명한 파레시아스트들입니다.[각주:13]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수감자들이든 ‘비정치적인’(de droit commun) 이유로 투옥된 수감자들이든, 1970년대에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감옥 체제의 일방성(arbitraire)에 맞서, 감옥정보집단(GIP)의 구성원들과 같은 지식인들과 의사들의 도움을 통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신들의 봉기(révolte)를 수행하는, 그러한 저항하는(se dressèrent) 수감자들은 그 자체로 파레시아스트들이며, 푸코는, 지식인들이 불관용-에-대한-연구(enquête-intolérance)에 특징적인 이름을 담지하는 비판적이고 투쟁적인 이러한 작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음에도, 이러한 작업의 장소, 말, 내용을 선택했던, 게다가 이 장소, 말, 내용에 그 형태를 부여했던 그러한 ‘이론’까지도 선택했던 이들은 바로 수감자들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각주:14][각주:15]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반체제적 저항자들’(dissidents) 또한 확실히 가장 순수한 유형의 파레시아스트들이며, 심지어 이 반체제적 저항자들은 파레시아라는 오래된 질문을 현재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정치적 비판의) 표현수단들과 양식들 중 몇몇을 발명해내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항자들(insurgés)[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폭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파레시아스트들입니다. 투쟁에, 자율성에, 자기-조직화에, 담론에, 다시 말해 표현과 언표행위의 차원에, 그러니까 말의 자유화/해방(libération)과 말하기의 권력의 정복 -이 말하기의 권력이 침묵이라는 바탕 위에서, 혹은 하나의 권력이나 하나의 규율이나 하나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강요된(imposée), 혹은 자발적 복종의 어떠한 양태(그것이 어떠한 양태이든)에 의해 자기 자신의 품행과 통치에 받아들여지고(acceptée) 통합된(incorporée), 그러한 침묵으로의 환원(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환원)이라는 바탕 위에서 등장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이 말하기의 권력이 다름아닌 침묵으로부터 도래하므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에 동시에 그리고 분리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반항자들의 근본적인 행동 속에는 어떠한 파레시아적 측면이 어찌되었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파레시아에 대한 묘사와 극화가 이러저러한 형태 하에서 제대로 현존하고 있지 않은 계기들은 푸코의 저작 내에서 사실은 거의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푸코의 저작이 중단되는 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발적인 계기 내에서만[즉 푸코 생애의 끝에 다다라서야만] 이 파레시아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 발견되고 논의되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네 번째로, 곧이어 우리는 파레시아라는 주제 혹은 이 파레시아의 이상형(idéal type)이라는 주제와, 푸코가 관계맺었던 혹은 푸코에게 특별한 관심을 촉발시켰던 동시대의 여러 사건들과 과정들 사이의 교통이 형성하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저는 수감자들, 광인들 그리고 소비에트의 반체제적 저항자들의 봉기(révoltes)라는 경우를 언급했습니다.[각주:16] 여기에 저는 다음의 두 가지 다른 경우들을,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 매우 다른 이 두 가지 다른 경우들에 대해 푸코가 어떻게 사고했는지에 관한 해석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한 이 두 가지 다른 경우들로부터 푸코가 이끌어냈던 실천적 결론들을 제기하는(그런데 이 문제들과 결론들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한 두 가지 다른 경우들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어들은 극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들은 언어와 행동 사이의 절합 -언어의 행동이 그 일부를 이루는 그러한 절합- 을 지배(commandent)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너무 간단히 취급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68년 5월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푸코가 이 68년 5월의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푸코가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하지만 또한 사후적으로 푸코가 68년 5월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 중 몇몇에 심원한 방식으로, 개량주의의 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는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혁명주의의 편에서도,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취하기’[발언권을 부여잡기/발언하기](prise de parole)로, 달리 말해 파레시아로 68년 5월 혁명의 정신을 정의했던 것은 다름아닌 바로 푸코의 가까운 친구이자 그와 함께 푸코가 탐구의 대상들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방법들 또한 공유했던 인물인 미셸 드 세르토였습니다.[각주:17] 첫 번째 경우보다 더욱 미묘한 두 번째 경우는 바로 1979년의 이란 ‘혁명’, 혹은, 푸코가 이렇게 명명하기를 선호했듯, 이란 인민의 봉기(soulèvement) -이 안에서 푸코는 본질적으로 정신적인(spirituel) 대중적 정치운동의 예시를 보았습니다- 입니다. 파레시아를 극화하고 양식화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속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장면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어떠한 한 인간이 주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주권자에 맞서 스스로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se lève(혹은 맞선다se dresse)”, 혹은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취함으로써” “회합 도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는 장면[.[각주:18] 저는 봉기(soulèvement)라는 질문과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점에서 이 스스로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이 봉기라는 질문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사후적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성찰일까요? 우리는 이란에서의 봉기(soulèvement)가 파레시아적 제스처를 개인에게서 집합체에게로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듦으로써 이 파레시아적 제스처가 취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단순히 예증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일반화 혹은 총체화 -헤겔이 말했던 Tun aller und jeder[각주:19]- 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푸코에게서 (근대적) 페르시아로부터 (고대적) 그리스로의 회귀와 대중적 봉기(soulèvement)에서 독특한 주체의 행동으로의 회귀 속에는 비판적인(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비판적인) 차원이 존재했다는 것이 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질문은 토론을, 게다가 논쟁을 지금까지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각주:20] 거칠게 정식화한 제 가설은, 푸코가 이란 혁명과 관련해 자신이 저질렀다는 점을 의식했던 그러한 정치적 오류가 푸코 자신 안에서 푸코 자신을 저항(insurrection)의 세속적(séculières) 차원들(확실히 푸코가 묘사한 바로서의 파레시아는, 말의 제스처로서, 현저하게 세속적입니다)에 대한 해명을 탐구하도록, 그리고 집합적 운동과 제도적 실천에서의 진실진술과 권위 사이의 혹은 이의제기(contestation)와 ‘지도’(direction)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설정을 심화시키도록 이끄는 그러한 반성적[성찰적] 운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논의의 이 첫 번째 계기를 결론짓기 위해, 말이라는 문제(공적인 말, 대항-권력으로서의 혹은 권력에 맞서는se dresse 것으로서의 말, 침묵을 깨는 혹은 표현의 금지를 위반하는 말)와 글쓰기 혹은 텍스트라는 문제(철학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리고 물론 문학적이든 말이죠)를 이 문제들 사이에서 절합하고자 시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푸코가 자기 고유의 글쓰기와 맺는 관계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푸코가 관심을 기울였던 모든 역사들/이야기들(histoires)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러하듯, 이 지점에서 모리스 블랑쇼를 참조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합니다. 바로 이 블랑쇼가, 사르트르를 포함한 여러 ‘보편적 지식인들’의 그늘 아래에서, “불복종 권리 선언”(Déclaration sur le droit à l’insoumission)(“121인의 선언”Manifeste des 121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알제리 투사들을 원조했던 탈주병들[전쟁 거부자들]과 ‘여행가방 운반자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보내면서,[각주:21] 알제리에서 프랑스 군대가 저질렀던 고문에 대한 비난을 1961년에 국가적 사건과 민족적 문제로 만들어냈던- 의 작성을 마무리지은 이이지요. 프랑스 지식인 일반에게, 그리고 분명 푸코 자신에게도, 이러한 역사적 제스처가 지니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시대적 맥락 내에서의 파레시아적 제스처의 모델 그 자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 또한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동일한 블랑쇼가, 사드 후작의 저작과 특히 “프랑스인들이여, 공화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더욱 노력하라!”라는 그의 연설(저는 다른 글에서 이 연설이 “121인의 선언”과 맺는 동족성을 증명하고자 시도했습니다)에 할애된 유명한 텍스트에서, 사드가 철학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식(그리고 블랑쇼 자신이 [이번에는 문학을 정의하기 위해] 문학에로 위치이동transposait시켰던 그러한 정식)을 부각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각주:22] 이는 파레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완벽한 정의 혹은 번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사드의 진실이 놓여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인간들이 두려움을 떨도록 만들든지간에, 철학은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 (…)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사드를 의심스러운 인물[즉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사드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기획을 위해, 이 기획의 실현 즉 사드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기 위해, 충분했다. 그리고 사드를 가두어버린 것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우리는 제1집정관[즉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여전히 사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동일한 죄목(exigence)으로 뒤쫓기고 있으니 말이다. 다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 자유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무제한의 운동은 이성의, 이성의 비밀스런 소망의, 이성의 광기의 유혹이다.[각주:23]
우리는, 그르노블 대학에서 파레시아에 관해 행한 1982년의 강연에서, 그리고 이 강연에서 그러한 것보다 더욱 빠르게 핵심으로 진입하는 1983년 가을의 버클리 대학에서의 강연들에서, 푸코가 파레시아의 어원적 의미가 바로 ‘모든 것을 말하기’(tout dire)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각주:24] 만일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베케트적인 ‘악을-말하기’(mal-dire)와 ‘말하기의 명령’(impératif du dire) 사이의, 그리고 또한, 그 반정립으로서, 라캉적인 ‘절반-말하기’(mi-dire) 사이의(분명히 이 세 가지 말하기들은 이 지점에 대한 푸코의 연구 그리고 정식화들의 배경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립해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진술(véridiction), 법률진술(juridiction), 대항진술(contradiction)
이제 ‘진실진술’의 형태들에 관한 푸코의 탐구에서 파레시아가 점하는 자리의 문제로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리스라는 주제 자체를 취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예비적 논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진실진술’ -파레시아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인, 혹은 파레시아가 그 본원적 정박점ancrage originaire을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것인- 에 대한 푸코의 연구를 (여러 언어들을 소환[활용]하면서) 구조화하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계열의 용어들에 대한 완벽한 묘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개요 정도는 제시해야 하겠죠. 프랑스어로 ‘참-말하기’(dire-vrai) 혹은 영어로 truth-telling이라고 번역되는 니체의 단어 Wahrsagen은 파레시아를 위한 하나의 본원적 자리를 어느 정도는 마련해주고(ménage) 있습니다.[각주:25] 저는 이 Wahrsagen이라는 니체의 단어가 파레시아를 위한 하나의 본원적 자리를 마련해준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푸코에게서 애초에는 진실진술이라는 문제가 파레시아에 의미있는(significative) 자리를 남겨놓지는 않는 그러한 용어들로[조건들 속에서] 구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제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푸코에게서 파레시아가 매우 일찍부터 비스듬한 방식으로 언급되었긴 했지만 말이죠. 푸코에게서, 파레시아는 진실진술에 과잉 속에서[초과하여](en excès) 그리고 사후적으로(après coup, nachträglich) 도래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파레시아의 진실진술에의 도래는 모든 담론적 구조가, 함축적으로, (그 조직화하는 과잉excès organisateur으로서의 기능 속에서 자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체계 전체에 대한 전복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진실진술의 형태의 시초적 현존(présence initiale) -비록 이것이 오인된 현존이라고는 해도- 에 의해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Wahrsagen 혹은 진실진술은, 의미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계열들 -푸코의 탐구 내에서 이 두 가지 계열들이 수행하는 구조화(structurante) 기능은 이미 증명된 것이어서 우리가 이를 또 다시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죠- 과의 교차점에 위치지어져(localisé)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계열들 중 하나는 제가 이미 앞서 언급하기 시작했던 딕시옹(dictions)이라는 계열입니다. 진실진술(véridiction)과 법률진술(juridiction) 혹은 법률권(jurisdiction) 사이의 반정립과 절합에 대한 작업은 푸코에게서 명시적으로 편재해(omniprésent) 있는 것입니다.[각주:26] 진실진술은 고해와 고백에서부터 법률진술[과 법률권]의 구멍 안에 점진적으로 자리잡게 되며,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은 이 진실진술이 법률진술[과 법률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해방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열을 더욱 확장시키고, 진실진술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장소로서의 제도들에 준거하고 있는 ‘알레투르기적인’(alèthurgiques) 다른 차원들을 이 계열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각주:27] 또한, 고해(confession), 회개(pénitence), 정당화/합법화(justification)의 문제설정 전체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확장과 포함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복(bénédiction)을 이 계열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각주:28] 하지만 물론 더 나아가 우리는 대항진술/모순의 문제설정 또한 언급해야만 하는데, 이 대항진술/모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이 지점에서, 진실진술이라는 첫 번째 축은 딕시옹(diction)이라는 질문이 픽시옹(fiction)[즉 허구] -그 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라는 질문과 대립하게 되는 장소인 법률진술이라는 두 번째 축과 교차하게 됩니다. 피에르 리비에르를 다시 떠올려봅시다. 리비에르 자신의 고해 혹은 자서전은 강제된 것(contrainte)임과 동시에 자신의 [자율적] 책임하에 행한(assumée) 하나의 ‘딕시옹’(diction) -혹은 이러한 ‘딕시옹’을 [강제로] 부과하는 권위에 맞서기 위해 되돌려진 그러한 딕시옹- 임과 동시에 하나의 픽시옹(fiction) 혹은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 하나의 ‘오토-픽시옹’[자기-허구]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고고학과 인식 형성체들(formations épistémiques)의 역사에 관한 자신의 초기 작업들에서부터 담론의 질서와 지식의 의지의 문제설정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푸코가 이 시기에도 진실진술 혹은 ‘참 말하기’(dire vrai)와 진실확인 일반 혹은 ‘참 행하기’(faire vrai) -객관성을 주장(prétend)하는 과학적 진실확인과 참을 ‘위조’(contrefait)하거나 모방(imite)하는 예술적 픽시옹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진실 관계들 혹은 진실 효과들에 역시나 몰두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각주:29] 만일 우리가 독일어 용어들의 계열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이 계열 안에서 Wahrsagen 옆에 Wahrnehmen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Wahrnehmen은 우리가 프랑스어로 ‘지각’(perception)이라고 번역하지만, (예를 들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는 심리학적 혹은 신경생리학적 작동을, 즉 확실성(certitude)과 진실(vérité) 사이의 모순(contradiction)이라는 일차적 형상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각주:30]
이 모든 것을 요약하기 위해, 우선 저는 푸코가 연구했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더욱 확장시켜볼 수 있을) 이러한 네트워크 전체가, 푸코가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언했던 그러한 원대한 기획, 그러니까 ‘진실의 역사’라는 기획을 (푸코가 자신의 탐구들을 [기존 지평으로부터 꺼내와] 다시 위치지었던 그러한 지평 내에서) 단어들의 수준에서 구조화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진실의 역사’는 파스칼적 기원을 지니는 정식인데요,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들 중에서 푸코가 아마도 이를 재발견한 -처음에는 인식론적인 의미/방향에서, 그 다음에는 (이 ‘진실의 역사’를 진실진술들의 혹은 참의 언표행위들의 그러니까 진실의 양태 내sub specie veritatis 담론의 하나의 역사 혹은 계보학과 명시적으로 동일시함에 이르기 위해) 이 ‘진실의 역사’를 ‘진실의 정치적 역사’로 재정식화함으로써- 최초의(그러니까 1961년에 처음으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각주:31] 하지만 진실진술들의 역사는 이 진실진술들의 다른 ‘딕시옹들’(이 딕시옹들은 법률진술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연히 법률진술들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죠)과의, 그리고 다른 진실 효과들(이 진실효과들은 과학적 진실확인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연히 과학적 진실확인들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죠)과의 절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법권리(droit)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이, 혹은 오히려 이 법권리와 과학의 언표행위적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이로부터 저의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suggestion)이 도출됩니다. 다수의 실천들과 담론들을 함축하는 이러한 잠재적(virtuel) 네트워크 내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사후적으로 추가할 때에만 가시적인 것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결여된 요소가 존재한다는 가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요소는 그럼에도 핵심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 요소의 추가는 문제의 모든 위치/입장(position)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가설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저는 이 요소가 바로 대항-진술/모-순(contra-diction) -여기에서 이 대항-진술/모-순을 명제들의 논리에 대한 정역학적(statique) 범주(이미 알다시피, 이 명제들 내에서 이 정역학적 범주는 동어반복tautologie과 대립됩니다)가 아니라 하나의 담론적 품행으로, 그래서 담론장 내에서의 하나의 행동으로(따라서 이미 이 담론적 품행 혹은 담론장 내 행동은 푸코가 부여했던 의미에서의 대항-품행입니다)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이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각주:32][각주:33]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대항진술/모순은 진실진술의 반정립적이고 갈등적인(agonistique) 하나의 형태이며, 이는 파레시아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름, 아니 오히려 이것이 파레시아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지점에서 저는 대항진술/모순(contradiction)과 ‘대항-말하기’(contre-dire)의 역사로서의(소피스트로부터 출발해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그[대항진술/모순 혹은 대항-말하기의] 역량과 함께 헤겔에까지 이르는, 혹은, 반정립적으로, 우상들에 대한 그[대항진술/모순 혹은 대항-말하기의] 파괴와 함께 니체에까지 이르는) 진실의 역사 혹은 계보학 전체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다루지 않고 넘어가서, 대항-진술/모-순(contra-diction)이 진실의 역사에 대해서(par rapport à) 그리고 이 진실의 역사의 실정성 -이전에 이미 언급되었던 바로서의(심지어 이 진실의 역사의 ‘정치적’ 변형태 내에서의) 실정성- 에 대해서 하나의 추가물(un ajout)로, 과잉으로(en excès) 돌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물 혹은 과잉은 계보학적 기획 전체에 자신의 의미/방향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의 2권과 3권의 뒷표지에 푸코가 넣은 르네 샤르(René Char)의 문장을 떠올리게 되죠.[각주:34]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의 동일한 어휘의 동의어들이 형성하는 기나긴 연속이다. 이에 대항해 말하는 것(contredire)은 하나의 의무(devoir)이다.”[각주:35] 그런데 의무(obligation)는 방법적 규칙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에 추가하도록 합시다. 파비엔 브리옹과 버나드 하코트가 “악을 행하고 참을 말하기. 사법에서 고백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루뱅 강연에서,[각주:36] 그리고 이와 동시대에 발표한 시론들과 콜레주 드 프랑스의 강의들에서, 푸코는 호메로스와 소포클레스에게서 의고시대 그리스의 알레투르기(alèthurgies)와 함께 시작하는, 그리고 고백의 기독교적 형상화들(configurations)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이 고백의 기독교적 형상화들은 형벌 제도의 중심에서 진실진술과 법률진술의 근대적 갈등(conflit)을 탄생시킵니다- 과 함께 지속되는, 그러한 단선적(linéaire)이면서도 간헐적인[지속적으로 중단되는](intermittente) 하나의 역사를 소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화가 주체화/복종(혹은 예속화)과 맺는 대항진술적/모순적(contradictoires) 관계들에 관한 하나의 계보학 기획의 한계를 구획하기 위해 이러한 의미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잘못] 믿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레시아에 관한 자신의 최후의 강의들과 함께, 푸코가, 특수한 하나의 대항-품행을 구성하는 (주체화와 진실진술의) 하나의 형상이 취하는 양태 내에서, 정치와 철학 사이의 절합에 이를 정도로까지, 하나의 결여된 고리를 복원하고 이 하나의 결여된 고리를 그 기원으로 다시 위치시켜놓았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실의 역사 전체 내에서(혹은, 더 정확히 말해, ‘참-말하기’dire-vrai의 역사 전체 내에서) 진실을 권력과 대립시키는 그리고 이 진실에 하나의 대항-권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응답들[반향들](répliques)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하나의 모델 혹은 어떠한 하나의 관념의 흔적(trace)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대항-진술/모-순의 혹은 (블랑쇼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텐데) 중단(interruption)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제스처(블랑쇼에게서, 이 중단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제스처의 원형은 항상 문학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것을 포괄해나갈 수 있거나 이 정치적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학적인 것이죠)의 반복(réitération) -현재성의 다른 조건들[각각의 현재들 혹은 현재성들이 취하는 조건들] 내에서의 반복- 에 대한 것입니다.
대립들의 체계와 도주선[각주:37]
그러므로, [진실진술의 한 유형으로서의] 대항-말하기라는 이러한 제스처는, 진실의 역사에 추가되는 하나의 추가물(un ajout) -진실진술의 다른 유형들에 대한 과잉으로(en excès) 형상화되는- 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항-말하기라는 이러한 제스처는, Wahrsagen이라는 유형 혹은 양식이 그러한 것처럼, 푸코가 “광기의 역사”와 바타이유 저작집에 붙이는 서문을 집필했을 당시 자주 원용했던 ‘위반’과 (하지만 서로 상당히 구별되는 [복수의] 양태들과 참조점들 내에서) 결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과잉적인 무엇(quelque chose d’excessif)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각주:38] 그런데 저에게는, 푸코에게서의 이러한 대항-말하기라는 제스처의 반향(résonance)을 염두에 두면서도, 자신의 최후의 강의들에서 푸코가 하나의 동일한 용어가 포괄(recouvre)하는 서로 다른 파레시아들parrêsias(혹은, 차라리 [s를 붙이는 대신에] 이 그리스어의 어미를 변화시켜, parrêsiai)의 체계를 조금씩 조금씩 재구성해나가는 유사-구조주의의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로 다른 파레시아들이 형성하는 체계는 단순하게 묘사적일 뿐인 하나의 계보학에 대한 것도 아니며, 하나의 원초적 의미/방향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의 파생물도 아니며, ‘참’인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의 최종적 의미/방향을 향한 전진도 아니며, 대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대립적인 형태들의 하나의 대칭적 배치(disposition)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바로 탁월한 점인 것인데요) 푸코가 구축해낸 것이 형식화에 혹은 최소한 도식화에 적합한 일종의 반정립들의 결정체(cristal d’antithèses)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반정립들의 장치(dispositif) 전체(ensemble)만이, 파레시아라는 이름이 포괄(recouvre)하는 문제를 지시해주면서, 이 파레시아를 ‘정의’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푸코는 에우리피데스의 “이온”에 대한 독해를 통해 자신의 파레시아의 형태들에 대한 탐구에 하나의 시작점(commencement)을 부여한 것과 달리 (이러한 시작점과 대칭적인) 종착점(fin)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레시아의 형태들에 대한 자신의 나열을 완료하는 한계점(clôture)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점을 자의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제가 결국 푸코에게서의 파레시아 형태들에 관한 하나의 단순화된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단순화와는 달리, 푸코는 파레시아의 새로운 양태들, 파레시아적 언표행위의 양식의 응답들(répliques)이, 명상의, 지혜의, 자기 배려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의(특히 파레시아가 제자의 것이 아니라 스승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등등)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실천들의 형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통치성의 형태 내에서도(특히 대신과 고문 혹은 [대문자] 군주의 ‘거울’이라는 형상들과 함께), 그리스 고전시대 이후 끊임없이 돌발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각주:39] 하지만 이 모든 형상들은, 파레시아를 어느 정도는 그리스의 문화적 장을 넘어선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파레시아를 리베르타스(libertas)로 재명명하며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로마의 도덕성[윤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가교를 구성하는 세네카라는 유명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는, 고전적[그리스 고전시대의] 파레시아의 타락(dégénérescences)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이 고전적 파레시아의 약화(affaiblissements)일 것입니다.[각주:40]
이제 제가 집중해 다루고자 하는 파레시아의 고전적[그리스 고전시대의] 형태들에 관해 말해보자면, 이 파레시아의 고전적 형태들의 가짓수는 넷,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디오게네스 그리고 인민주의 웅변가 혹은 인민선동가(우리는 이 인민주의 웅변가 혹은 인민선동가로 고전 문헌에서의 클레온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각주:41])라는 이름들로 좌표가 설정된 대립들의 이중체계를 따라, 둘 곱하기 둘입니다. 이 체계의 양극성은 다음과 같이 조직화됩니다. 우선 ‘정치적’이라고 불리는 파레시아와 ‘철학적’이라고 불리는 파레시아 사이의 분할이 존재하며, 그 다음으로 이 두 파레시아들 각각은 반정립적인 두 형상들[인물들]로 하위분할됩니다. 정치적 파레시아의 측면에서, 본래적 파레시아스트(즉 페리클레스)가 존재하는데, 이 본래적 파레시아스트는 진정한 진실의 용기를 보여주며, 그의 야심은 자신의 동료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émulation)를 생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위하는 방식으로 도시(cité)를 지도(diriger)하는 것이고, 이 본래적 파레시아스트는 자신을 모방하는 경쟁자인 인민선동가(즉 클레온)를 반정립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인민선동가는, 파레시아를 모든 이(tous)에게 분배함으로써 이렇게 다중의 확신들(convictions)에 진실의 외양을 부여하거나 이 모든 이의 의견으로 진실을 대체해버림으로써 파레시아를 ‘민주화’(démocratiser)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적 파레시아의 측면에서, 일차적인 수준에서는 앞서와 같은 의미에서의 위계 혹은 가치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이 가치판단이 비밀스럽게 전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대신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적 유형의 파레시아(소크라테스의 기능[역할]은 대화dialogue를 실천함으로써 -이 대화는 바로 이러한 실천으로 인해 철학적 훈련exercice의 매개물medium 그 자체가 되는데- 자신의 동료 시민들이기도 한 이 대화상대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품행을 도래할 죽음 -이들에게는 진실의 순간/계기moment가 될- 의 관점에서 점검해야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와 다른 한편으로는 디오게네스가 구현하고 있는 ‘견유주의적’ 파레시아 사이의 단순한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42]
이 지점에서, 많은 수의 푸코의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푸코의 텍스트 내에서 생산됩니다. ‘철학적’ 파레시아의 유형적인[전형적인] 두 명의 대표자들인 소크라테스와 디오게네스(디오게네스는 소크레타스의 냉소적 분신입니다[각주:43]) 사이의 하나의 평행성에서 출발하는 푸코의 이러한 설명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1984년 2월 29일의 강의에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회기들에서도 다루어질) 하나의 기나긴 검토[분석] -이 검토 속에서 견유주의는, 서구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의 용기’의 각각의 [대표적] 인물들(물론, ‘투사’라는 유형과 함께, 푸코에게서 그 특권화된 예시인 혁명적 활동으로서의 삶을 포함하여)을 정상성(normalité)과 예의(bienséance)와의 ‘추문적 단절’(rupture scandaleuse)로 변형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초역사적 범주가 됩니다- 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 결정적 요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디오게네스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고전적 파레시아의 체계 내부의(à l’intérieur) 과잉으로서의 이러한 인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 파레시아의 체계는 하나의 허상적[허울뿐인] 완전성만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파레시아의 체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식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정확히, 파레시아의 ‘가장자리’[경계]와 그 ‘대항-진술/모-순’의 기능이 표상되기 위해, 우리는 디오게네스를 (비록, 어떠한 의미에서는, 디오게네스가 도시를 구성하는 ‘담론의 유들genres’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제시키기는 하지만) 포함시켜야만 합니다.[각주:44] 따라서 우리는 디오게네스라는 유형을 ‘파레시아스트’의 극한으로 특징지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푸코에 대한 권위 있는 몇몇 해석가들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는데요, 저는 디오게네스가 ‘담론’에 대립되는 ‘삶’을 표상한다고, 혹은 디오게네스가 담론의 한 형태와는 대립되는 삶의 한 형태로, 담론적인(discursive) 혹은 대화적인(dialogique) 한 진실과는 대립되는 체화된(incorporée) 혹은 육화된(incarnée) 한 진실로 철학이 전치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구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각주:45] 담론과 삶은,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이 담론과 삶이 동일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절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오게네스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물론 분명 소크라테스의 경우와 디오게네스의 경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디오게네스가 이차적 수준의(au second degré) ‘대항-담론’을, 혹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원하신다면) 하나의 성찰적 부정성을 예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차적 수준의 대항-담론이란 상징적 제스처들(벌거벗은 채로 산책을 하는 것 혹은 개처럼 짓는 것과 같은)과 부정의 태도들(질문에 답변하지 않기, 대화와 교통의 의무 -도시의 삶에 대한 참여로서의 철학은 이러한 의무 위에 정초되어 있는데도- 와 단절하는 침묵 지키기, 추함과 가난을 찬양하기, 화폐 위조 등을 신성한 임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와 같은, 디오게네스를 근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한 명의 비도덕주의자만큼이나 한 명의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 아폴리스apolis 즉 ‘비-시민’이라고 부르는 바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입장들)이라는 형태로 담론성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요.[각주:46] 물론 이러한 제스처와 태도 또한 역시 언어의 한 방식이며 침묵의 목소리이지만, 이 제스처와 태도는 반작용(réaction)을 통해 말을 생성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되곤 하는 관습들을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각주:47] 진실진술은 항구적 ‘추문’이 됩니다. 혹은 추문이 하나의 도발인 것이죠.[각주:48]
따라서 이 파레시아의 체계는 [디오게네스라는] 그 내적 과잉(excès interne) 혹은 그 도주선(ligne de fuite)과 함께(avec) 완성됩니다. 이 파레시아의 체계는 정치와 철학 사이의 거대한 분할의 이편과 저편에 위치해 있는 두 명의 실정적(positives) 혹은 긍정적(affirmatives) 형상들, 즉 우리의 고전적 유산의 ‘실정적 영웅들’인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부정적 형상들 즉 인민선동 정치가라는 [클레온의] 형상과 견유주의적 반철학자라는 [디오게네스의] 형상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부정적 형상들은 서로간에 완전히 다른 의미/방향에서의 그리고 대립되는 가치평가 하에서의 부정성을 구현합니다. 인민선동가는 그럼에도 형식적으로는 파레시아스트인 반면(이 인민선동가가 형식적으로는 파레시아스트라는 점을, 우리는 “인민선동가란 누구인가?” 혹은 “인민주의자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전히 거대한 현재성을 지니지만 항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나 혹은 심지어는 결정불가능한 것으로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철학적 견유주의자는 파레시아의 실행(exercice)에 하나의 종말론적 한계를 도입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한계 또한 (푸코에게서 조금 더 뒤에서 출현하게 되는, 그리고 명백한 방식으로 푸코의 담론에 귀신처럼 들러붙어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말해보자면) ‘최후의 인간’과 ‘초인’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기에 사실은 매우 비규정적인 것이죠.[각주:49] 따라서, 정치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 사이의 대립선과 교차하는 이러한 두 번째 대립선은, 비규정성과 양가성의 영역을 열어젖히는, (용기있는 품행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규범지어(normé)지고 규범적(normatif)인 담론과 규칙에서 벗어나(déréglé) 있으며 규칙을 깨뜨리는(déréglant) 담론 혹은 유사-담론 사이의 균열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들의 두 가지 선들이 정확히 동일한 차원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립들의 두 가지 선들 중에서 바로 대립들의 두 번째 선[실정적/긍정적 형상들(페리클레스 + 소크라테스)과 부정적 형상들(클레온 + 디오게네스) 사이의 대립선]이 첫 번째 선[정치적인 것(페리클레스 + 클레온)과 철학적인 것(소크라테스 + 디오게네스) 사이의 대립선]을 과잉결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견유주의자의 반철학 또한 인민선동가의 타락한 정치와의(avec),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나머지 모든 것들과의(avec) 경쟁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각주:50][각주:51]
도식1
정직한 정치(페리클레스) |
철학(소크라테스) |
인민선동적 정치(클레온) |
비정치적 반철학(디오게네스) |
도식2
페리클레스 + + |
소크라테스 + - |
클레온 - + |
디오게네스 - - |
파레시아와 두나스테이아(Dunasteia): ‘민주주의적’ 개인성
비록, 분명 저의 이 모든 설명이 푸코의 텍스트들에 대한 ([그 실제 내용으로부터 조금은] 동떨어진) 하나의 스케치(esquisse) -이 푸코의 텍스트들에 대한 주의 깊은 재독해라는 과정(épreuve)을 결여하고 있는- 를 구성할 뿐이라고 해도, 저는 제가 파레시아라는 문제와 계몽에 대한 칸트의 텍스트에 관한 푸코의 반복적인 심문[분석] 사이의 절합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결론적 가설로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특히 비판이라는 관념의 의미/방향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 자신과 동시대의 저작들 가운데에 하나의 구분선을 그려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푸코는 무엇을 위해 고대적 파레시아의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활용들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론적 복합체(complexe)를 해명하는 일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독해를 할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즉 파레시아를 탐구하는 시기의 푸코가] 하버마스가 푸코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혹은 하버마스 자신이 푸코의 입장이라고 믿었던 바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논쟁을 위해 자신의 몇몇 글들을 출판했던 그 시기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맙시다. [파레시아를 탐구하는 시기의 푸코에게는 하버마스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 시기가 바로 현재성인 것이죠. 뤼디 레오넬리는 정당하게도 이러한 푸코와 하버마스 사이의 대결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결의 지형도를 완벽하게 재구성합니다.[각주:52] 그렇지만 레오넬리는 파레시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파레시아라는 질문은 계몽과 관계된 이러한 푸코와 하버마스 사이의 논쟁이 자신의 대상으로 취하는 근대성이라는 장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파레시아라는 질문이, 탈중심화(décentrement)의 작동자로서, 이 푸코와 하버마스 사이의 논쟁 안으로 그 완전한 권리를 지니면서 진입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쟁점이 되는 지식인이라는 [‘파레시아스트’와 상관적인] 범주에 충분히 넓은 유효범위를 부여한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저는 파레시아스트가, 자신을 하나의 문제설정적[문제적] 인물로, 대립들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체로, 심지어 (견유주의자의 경우에까지 이르면) 이 인물 자신과도 대립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재적 다수성(multiplicité intrinsèque) 내에서, 푸코에게 소위 ‘보편적 지식인’이라 불리는 바와 푸코가 한때 (자기 스스로를 수식하기 위해) 사용한 ‘특수한 지식인’ -‘[대문자] 군주의 조언자’에 대립되는 ‘봉기(soulèvements)의 조언자’ 혹은 대항-전문가(contre-expert)의 기능과 혼동될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푸코 자신이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봉기의 조언자’ 혹은 대항-전문가의 기능을 수행한 바 있음에도 말이죠)- 이라 불렀던 바 사이의 제3의 길을 열어젖힐 가능성을 표상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각주:53] 이상적 파레시아스트는, 푸코의 파레시아에 대한 탐구가 보여주었듯, 또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와 철학적인 것의 우위(이 두 가지 우위는 [정치적인 것의 우위의 경우] ‘타자들에 대한 통치’와 [철학적인 것의 우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 혹은 자기의 배려라는 두 가지 방향설정들orientations입니다) 사이에서 분할된(divisé), 심지어는 사지가 찢어져버린(écartelé) 파레시아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설정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질적인 것으로 남아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뒤섞이지, 서로가 서로의 위에서 재정초되고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방향설정들 사이의 불가능한 교차에 이를 정도로까지, 독특한 지식인과 같은 혹은 역사적 독특성들(달리 말해 현재성의 계기들)과 관계 맺게 되는 지식인과 같은 무언가(quelque chose)가 돌발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지식인이란, ‘보편적’이지도 ‘특수’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담론의 형태 내에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구별 너머에(par-delà) 스스로를 위치짓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이 독특한 지식인은, 현재란, 자신의 권리와 의무란,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가능한 것이란 -이 모든 것들은 이 독특한 지식인 자신 안에 이미 담겨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이제, 이미 앞에서도 한 번 등장했던 단어인 민주주의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잘 알려진 곤란들[난점들]로 되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는 푸코가 연극적 방식(dramaturgie)으로 묘사했던 파레시아적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야 합니다. 담론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절합에 관한 푸코 시대의 분석들에서 만능열쇠가 되어버린 ‘화용론’(pragmatique)이라는 관념에 맞서, 푸코는 ‘담론의 연극성(dramatique)’에 대한 언표를 주조하면서 그 대신 수행성이라는 통념 -최소한, 이 수행성의 행위자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는, 그 용어의 협소하게 제도적인 전통적 해석에서의 수행성이라는 통념 말이죠- 은 거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각주:54]
이 지점에서 우리는 푸코가 제시하는 두 가지 지표들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푸코가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인용하는 이야기, 즉 플루타르코스가 이야기하는 원초적 장면과 관계된 것입니다. “한 남자가 폭군에 맞서면서(se dresse) 이 폭군에게 진실을 말한다.”[각주:55] 자신의 삶에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치르면서, 플라톤은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의 폭군의 기대와 이 폭군의 향락의 윤리에 정확히 대립하는 방향의 조언을 정식화하기 위해 디오니시우스에 맞섭니다(se dresse).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진실의 용기’라는 표현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용기라는 표현 내에는 개인적 위험(risque personnel)이 그리고 (파레시아의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죽음을 건 맞섬(face à face avec la mort)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위험과 죽음을 건 맞섬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두 요소들이, 존재의 미학(esthétique de l’existence)의 통합적 일부(partie intégrante)를 형성하는 죽음의 위험과 방식에서 하나 이상의 위험들이 그리고 죽음에 맞서는 하나 이상의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들을 취한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요소들 중 그 어떠한 것도 헤겔 변증법의 ‘[대문자] 절대 주인’과의 대립으로도, 하이데거적인 실존 분석론(analytique existentiale)의 ‘죽음을 위한 존재’(être pour la mort)와의 대립으로도 환원 불가능합니다. 이는 또 하나의 다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적(possible) 죽음과의 관계 -공포라는 이미지와 위반이라는 작용/놀이(jeu) 모두로부터 동일하게 멀어져 있는- 는 푸코가 참-말하기(dire-vrai)의 주체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자들과 체결한 ‘파레시아적 계약’이라 부르는 바의 본질적 구성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요소[즉 두 번째 지표]와 관련해 말해보자면, 이 두 번째 요소는 특히 푸코가 아고라에서의 논쟁들(débats)과 논박들(contestations)의 한가운데에서 페리클레스가 취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출현합니다. 이 아고라는 투쟁하는 의견들 혹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당파들이 도시에 대한 지도(direction des affaires)를 열망하는 자신들의 리더들(leaders)과 함께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공간이죠.[각주:56] 말에 대한 권리(이세고리아)의 평등성에 의해 규범지어짐(normé)과 동시에 분할(divisé)되는 ‘갈등적(agonistique) 장’ 내에서,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지배력’(ascendant)을 행사합니다. 혹은 페리클레스는 도시를 ‘좋은 정치’ 즉 ‘정직한 정치’(이 정직한 정치는 철학자들이 이후에 폴리테이아politeia 그 자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와 결합시킬 수 있는 (순수하게 담론적인) 권력을 진실의 언표행위에 부여하기 위해 ‘전면에’(au premier plan) 등장합니다.[각주:57][각주:58][각주:59] 푸코는 이러한 갈등성(agonisme)에 두나스테이아라는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 두나스테이아는 그리스 정치의 어휘들 중에서 핵심적인 용어이지만 우리 언어로 번역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이전에 푸코가 아곤(agôn)에 대한 호메로스식 설명들(tableaux)에 대한 자신의 독해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두나스테이아는 지배/명령(commander)할 수 있는 역량이며, 따라서 두나스테이아는 투라니스(turannis) -소포클레스 비극의 제목인 “오이디푸스 왕”(Oidipous Turannos)이 보여주듯 투라니스는 전제정치(tyrannie)보다는 왕권(royauté)을 의미하죠- 와 긴밀한 친화성들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 두나스테이아는, 이 두나스테이아가 어떠한 지위(status) 혹은 직위(titre)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심지어 그것이 선출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라 해도) 상황 속에서의 덕(vertu)과 행위 역량을 함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라니스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각주:60]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두나스테이아를, 권력 혹은 권위라는 관념을 시작, 원리, 기원이라는 관념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리스인들의 형이상학과 인간학의 근본 범주로서의 아르케(archè)와 관계 맺도록 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나스테이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따른다면(“정치학” 3권), 어떠한 민주주의적 체제 내에서 인민에 혹은 시민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일반 주권(souveraineté générique)에서부터 통치의 과업들이 분배되는 자리들로서의 직들(charges) 혹은 관들(magistratures)[가령 ‘행정직’이나 ‘행정관’이라고 말할 때의 ‘직’이나 ‘관’]이라는 관념에까지 이르는 스펙트럼 전체를 포괄(couvre)하는 그러한 관념이지요.
그렇지만 이 두나스테이아 안에는 대체보충적인 개인화라는 요소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라틴어로(그리고 아렌트Arendt, 코제브Kojève 혹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권력의 언어에 관한 성찰들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지배력(ascendant)으로서의 두나스테이아에 대한 좋은 등가어는 라틴어 아욱토리타스(auctoritas)일 것입니다. 이 아욱토리타스라는 단어에, 저자(auteur) 기능으로의 진입(entrée)이라는, (개인들이 진실에 대한 옹호를 자신들의 과업으로 삼고, 이에 따라 이 개인들이 언표하는 바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그 결과들이 초래하는 위험을 떠맡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정치적 진실의 장 내로의 입문(initiation) 혹은 시작(commencement)이라는 가치[의미]를 문자 그대로 부여한다는 조건에서 말이죠.[각주:61][각주:62] 이러한 권위는 [외부에서 부여됨으로써]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어떠한 자질(qualité) 혹은 세습받거나 선출되는 어떠한 기능과 동시에 우리에게 투여되는 어떠한 자질인 것이 아니라,[각주:63]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회합에서 스스로의 몸을 일으키는(se lève) 순간, 우리가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아가는(s’avance) 순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고(parler) 지배/명령할(commander) 동등한 권리(이소노미아와 이세고리아)를 가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창조해내는 그러한 자질입니다.[각주:64] 이는, 참-말하기(dire-vrai)라는 예시 그 자체를 통해, 최소한 어떤 특정한 계기에서는 가치를 지니게 되며 시민들과 도시를 이 시민들의 동의와 함께 통치하게 해주면서도 오류와 비-인민성[인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음](impopularité)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결정의 능력 혹은 더 우월한 명석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푸코에 따르면 파레시아적 개입들의 공통 특징이 사전적으로 부여된 바로서의 담론의 질서 -이 담론에 대한 분배와 보증과 함께 부여된 바로서의 질서- 에 관한 확인[규정](confirmation) 전체와는 대립적으로 비규정성의 공간을 열어젖히는 것이라는, 혹은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텐데) 철학에서 그러하든 정치에서 그러하든 혹은 이 두 차원 모두에서 그러하든 규범의 타당성(validité de la norme)을 (가능하다면 이 규범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중지시키는 것이라는 사실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상관적으로, 여기에서 언급된 행동의 덕과 능력이 최소한 전통적인 의미 내에서는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모델에 조응한다는 점을 지적해두는 것이 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각주:65]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관념은 본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푸코가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se souciait de)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각주:66] 푸코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보존(conservation) 혹은 재생(régénération)을 가지고서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은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관념은, 만일 우리가 이 관념을 정치의 상호성과 의사소통적 행위에 대한 하버마스의 규범적 개념화들과 대립시키게 된다면. 그만큼 더욱 역설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푸코에게서 민주주의의 보존은 민주주의의 인민선동으로의 타락, 특수한 일부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과두제로의 타락, 선출의 기구(machines)와 교통의 대리기구(agences)에 의한 지배로의 타락 등등, 이 타락들과는 대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항-품행들을 거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푸코에게서 이 민주주의의 보존은 유사 귀족정치적(quasi aristocratique) 차원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귀족정치는 혈통(결국에는 이름)에 속하는 정치도, 사회계급에 속하는 정치도, 부 혹은 심지어는 전문적 능력과 지식에 속하는 정치도 아니며, 대신 특수한 의미/방향에서의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도된 그러한 ‘귀족정치적 힘’(force aristocratique)에 대한 것입니다. 두나스테이아라고 이름 붙여진 종류의 권력 혹은 권위는 [파레시아와 두나스테이아 사이의] 상호적 선전제(présupposition)의 원환 내에서 파레시아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래서 진실 효과는, 이 권력이 돌발한다면 그리고 이 권력이 돌발할 때에, 하지만 이 권력 그 자체가 지배, 규율, 규범성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권력이 제도에 대한(par rapport à) 과잉으로서 집요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참-말하기’(dire-vrai)의 위험스런 실행(exercice)과 순수하게 일치할 때에, 생산되는 것입니다.[각주:67] 따라서 이러한 권력은 취약하고 우연적이며 항상 실패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위험을 취하도록 경향지어져 있습니다(우리는 직업 정치가들이 -말하자면- 전혀 이러한 위험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비록 사정이 이러한 만큼 [비교가 되어] 더욱 탁월한 것이 되곤 하는 몇몇 예외들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말이죠 - 그러면서도 이 직업 정치가들은 ‘참 말하기’라는 요구를 많이도 하곤 합니다).[각주:68] 그렇지만 이러한 권력은 (아테네인들의 에클레시아ekklèsia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구성되지요. 비록 이것이 교통을 중단시킴으로써 이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의 기능작용(fonctionnement)과 배열(ordonnance)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정상적 교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대항-교통’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은 [성공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실패한다면] 사소한 것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통은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게 되거나 [실패한다면] 무용한 것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념은, 모든 민주주의는 ‘권력들 사이의 분할’을 통해 자신의 한가운데에서 군주정치적인 혹은 과두정치적인 기원을 지니는 요소들(대통령제적인 행정기능, 사법관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출, 로비와 전문가의 권력)을 수용하는 한에서만 생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혼합적 구성/헌정’(constitution mixte)이라는 관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몽테스키외와 그 후대의 인물들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파레시아와 두나스테이아로의, 그리고 그리스라는 도시 -그 안에서 철학은 중심적이면서 동시에 항상 거부되는(contestée)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 제도들과 이 둘[즉 파레시아와 두나스테이아] 사이의 절합으로의 시대착오적 회귀를 통해 푸코가 묘사 혹은 제시하는 바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자신의 원리로 되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교란적 개입(intervention perturbatrice)의 필연성입니다.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귀족정치적 혹은 유사 귀족정치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정교분리적인[세속적인](laïque)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어떠한 예언자의 개입 혹은 심지어 베버 식의 카리스마적인 예외적 인물의 개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자유와 평등의 안정된 하나의 제도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지 민주주의적 대항-진술/모-순의 계기들만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존 진실진술과 법률진술과 이 계기들 자신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탁월한 민주주의적 행동을 표상하는 ‘대항-민주주의’의 하나의 형상(정치와 지성이 서로 마주칠se rencontrer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을 그리스인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20세기 말의 푸코의 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유산은 취합하기(recueillir)에,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시대로 그] 자리를 이동시키기(transposer)에 더욱 어려운 것일 겁니다. ‘추문’과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화/허가(autorisation)’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귀족정치주의(aristocratisme)는 어떤 특정한 평등의 제도(화)(institution de l’égalité)를 그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지니고 있는 것 아닐까요?[각주:69] 이 역설적인 귀족정치주의가 담론의 질서를 괴롭히면서(dérangeant) (하나의 대항-진술/모-순과 하나의 대항점contrepoint의 자격으로) 대립적인 방식으로(en contre) 돌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제도(화)가 이미 제거되고 무력화되며 그 본성이 훼손되고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전체적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귀족정치주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각주:70]
쾨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 칸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힘을 뺀 비둘기는 자신이 진공 속에서 더 잘 날 수 있을거라고 상상할 것이다.”[각주:71][각주:72] [끝]
- 이 글은 2016년 6월 1일 파리-에스트 크레테이유 대학(université Paris-Est Créteil)에서 열린 학술대회 “미셸 푸코와 주체화”(Michel Foucault et la subjectivation)에서 내가 행한 발표를 글로 옮긴 것이다. 이 발표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의 휘트니 휴머니티스 센터(Whitney Humanities Center)에서 열린 콜로퀴엄 “1984년 이후의 푸코”(Foucault: After 1984)에서 내가 2014년 10월 18일 영어로 행한 강연의 내용을 다시 취해 수정한 것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이 장의 제목은 “Dire, contredire: sur les formes de la parrêsia selon Foucault”이며, ‘말하기’는 dire를, ‘대항말하기’는 contredire를 옮긴 것이다. 프랑스어에서 contredire는 ‘반대하다’, ‘반박하다’ 혹은 ‘모순되다’, ‘어긋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명사형인 contradiction이 바로 ‘모순’ 혹은 ‘대항진술’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발리바르의 다른 텍스트들이 그러하듯 이 텍스트 또한 프랑스어 사용자에게조차 읽기에 전혀 녹록치 않으며, 그래서 외국어 번역본으로 읽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옮긴이가 최대한 노력을 쏟기는 했지만, 역시 독자들에게 읽기가 쉬운 번역본은 전혀 아닌 만큼 불필요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수의 번역어들의 원어를 밝히도록 한다. parrêsia(프랑스어로는 parrhèsia이며, 그리스어로는 정확히 parrêsía인데, 서구에서도 현재 여러 표기형태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파레시아’로 음독하며, parrêsia를 행하는 이인 parrêsiaste는 ‘파레시아스트’로 음독한다(본문에서 발리바르도 지적하듯, pan과 rhesis가 합쳐진 파레시아는 ‘모든 것을 말하기’를 뜻한다). 또한 이 텍스트에서 모든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영어와 독일어는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는데, 번역에서는 이탤릭체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발리바르는 diction을 통한 말놀이를 끊임없이 전개하는데, véridiction은 ‘진실진술’, vérification은 ‘진실확인’, juridiction은 ‘법률진술’, jurisdiction은 (아쉽게도 diction을 살려주지는 못하는 번역어지만) ‘법률권’, contradiction은 ‘대항진술/모순’으로 옮긴다. diction은 ‘진술’이라고 옮기기보다는 ‘딕시옹’으로 음차하며, fiction 또한 ‘픽션’이나 ‘허구’가 아니라 ‘픽시옹’으로 음차한다. prendre는 그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 많은 경우 ‘취하다’로 옮긴다. vérité는 (‘진리’보다는) ‘진실’로, vrai는 ‘참’으로 옮긴다. ancien과 antique은 ‘고대적’으로, archaïque은 ‘의고적’으로, classique은 ‘고전적’으로 옮긴다(이 때의 ‘고전적’은 프랑스의 ‘고전주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자). norme는 ‘규범’으로, normal은 ‘정상적’으로, normatif는 ‘규범적’으로, normalité는 ‘정상성’으로 옮긴다. discipline은 ‘규율’로, disciplinaire는 ‘규율적’으로 옮긴다. parole은 ‘말’로, mot는 ‘단어’로, dire와 parler는 ‘말하기’로 옮긴다. aveu는 ‘고백’으로, confession은 ‘고해’로 옮긴다. énoncé는 ‘언표’로, énonciation은 ‘언표행위’로, énonciatif는 ‘언표행위적’으로 옮긴다. type는 ‘유형’으로, style은 ‘양식’으로, stylisation은 ‘양식화’로 옮긴다. actualité는 현재성으로, présent은 ‘현재’로, présence는 ‘현존’으로 옮긴다. intellectuel universel은 ‘보편적 지식인’으로, intellectuel spécifique은 ‘특수한 지식인’으로, intellectuel singulier는 ‘독특한 지식인’으로, 그래서 singularité는 ‘독특성’으로 옮긴다. multitude는 ‘다중’으로, masse는 ‘대중’으로, collectivité는 ‘집합체’로 옮긴다. (‘자리이동’이라는 의미의) déplacer는 ‘전치’로(transposer는 원어병기한 ‘자리이동’으로), placer와 situer는 ‘위치짓다’나 ‘위치시키다’로, place는 ‘자리’로 옮긴다. populiste는 ‘인민주의자’로, démagogue는 ‘인민선동가’로, cynique은 ‘견유주의자’로, scandale은 (‘스캔들’보다는) ‘추문’으로, provocation은 ‘도발’로 옮긴다. enseignement은 ‘가르침’으로, cours는 ‘강의’나 ‘강연’으로 옮긴다. authentique는 ‘본래적인’으로, originaire는 ‘본원적인’으로 옮긴다. subjectivation은 ‘주체화’로, assujettissement은 ‘예속화’로, sujétion은 ‘주체화/복종’으로 옮긴다. signification은 ‘의미’로(이는 ‘의미작용’을 뜻하기도 한다), sens는 ‘의미/방향’으로, 딱히 구별해줄 필요는 없어서 acception 또한 ‘의미’로 옮긴다. œuvre는 ‘저작’으로 옮기는데, 이 단어에는 ‘저작’, ‘작업’, ‘작품’이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 individualité는 (‘개체성’보다는) ‘개인성’으로, 따라서 individualisation은 ‘개인화’로 옮긴다. puissance는 ‘역량’으로, pouvoir는 ‘권력’으로, autorité는 ‘권위’로, capacité는 ‘능력’으로 옮긴다. décision은 ‘결정’으로, détermination은 ‘규정성’으로, indétermination은 ‘비규정성’으로, indécidable은 ‘결정불가능한’으로 옮긴다. 들뢰즈의 개념인 ligne de fuite는 (‘탈주선’보다는) ‘도주선’으로, problématiser는 ‘문제화하다’로, problématisation은 ‘문제화’로, problématique은 ‘문제설정’으로, la politique은 ‘정치’로, le politique은 ‘정치적인 것’으로, sémantique은 ‘의미론’으로, notion은 ‘통념’으로, concept는 ‘개념’으로, surgir는 ‘돌발’로, position은 ‘위치’ 혹은 ‘입장’으로, articulation은 ‘절합’으로, excès는 ‘과잉’으로, élaborer는 ‘정교구성’으로, conception은 ‘개념화’로, enquête는 ‘탐구’로, dérivation은 ‘파생물’로, description은 (‘기술’보다는) ‘묘사’로, apparence는 ‘외양’으로, cité는 ‘도시’로, hanter는 ‘귀신처럼 들러붙어 있다’로, conduite는 ‘품행’으로, 데리다의 용어인 supplémentaire는 ‘대체보충적’으로, geste는 영어식으로 음차하여 ‘제스처’로, quasi는 (‘준’보다는) ‘유사’로, polarité는 ‘양극성’으로(polarisé는 ‘양극화된’으로), opérateur는 ‘작동자’로, opération은 ‘작동’으로, portée는 ‘유효범위’로, multiplicité는 ‘다수성’으로, variente는 ‘변형태’로, recouper는 ‘교차’로(“안티 오이디푸스” 번역본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인데, recouper에는 ‘재절단’이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으며,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한다는 의미만 존재한다), croisement은 ‘교차점’으로, réflexif는 ‘성찰적’ 혹은 ‘반성적’으로, écriture는 (이 글에서는 ‘문자기록’ 등 보다는) ‘글쓰기’로, figure는 맥락에 따라 ‘형상’ 혹은 ‘인물’로, figurer는 (‘나타나다’ 혹은 ‘등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형상화하다’로, idéal은 (‘관념적인’보다는) ‘이상적인’으로, ‘주도권’과 ‘구상’을 의미하는 initiative는 음차하여 ‘이니셔티브’로, servitude volontaire는 (에티엔 드 보에시의 저서 제목의 한국어 번역을 따라) ‘자발적 복종’으로, 알튀세르의 용어인 ligne de démarcation은 ‘구분선’으로, (‘의회’라는 뜻이 들어있는) assemblée는 ‘회합’으로, communication은 ‘교통’으로, 하지만 하버마스의 agir communicationnel이라는 개념은 기존 번역관례에 따라 ‘의사소통적 행위’로, dégénérescence는 ‘타락’으로, statut는 ‘지위’로, peuple은 ‘인민’으로, aléatoire는 ‘우연적’으로, ‘대립적’이라는 의미의 antithèse는 (‘안티테제’로 음차하기보다는) ‘반정립’으로, modalité는 ‘양태’로, complémentarité는 ‘상보성’으로, rapprocher는 ‘상호접근’으로, transgression은 ‘위반’으로, (‘무대’와 ‘장면’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scène은 ‘장면’으로, intention은 ‘의도’로, nom은 맥락에 따라 ‘이름’ 또는 ‘명사’로, moment은 대부분 ‘계기’로 옮기면서도 필요한 경우 ‘순간’이나 ‘시기’ 등으로 옮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조금 의역하자면 이는 “사람들이 말한다는게 뭐 그리 두려운걸까요?” 정도로 옮길 수 있다. [본문으로]
- 내가 여기에서 준거하는 텍스트들은, 한편으로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두 해의 강의인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1982-1983)(Le Seuil/Gallimard, 2008)와 Le Courage de la vérité(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II)(1984)(Le Seuil/Gallimard, 2009)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Discourse and Truth. The Problematization of Parrhesia(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5)라는 제목으로 녹취록이 만들어져 출간된 1983년의 버클리 강연들이다. 후자는 Fearless Speech라는 제목으로 Semiotext(e) 출판사에서 2001년 재판이 나왔으며, 결국 프랑스어로는 Discours et vérité(Paris, Vrin, 2016)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이 프랑스어판에는 파레시아를 대상으로 한 1982년의 그르노블 대학에서의 강연이 수록되어 있다)(이 그르노블 강연의 제목이 La Parrêsia이다 - 옮긴이). 푸코의 주석가들 가운데에서, 존 라이크만(John Rajchman)은 이 파레시아라는 주제계를 동시대 철학 내 권력과 담론에 대한 다른 문제화들과 관계맺도록 함으로써 이 주제계의 중요성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내었다. 그의 저서 Truth and Eros. Foucault, Lacan, and the Question of Ethics, Oxford, Routledge, 2009를 참조하라(이 저서의 불역본으로는, Érotique de la vérité. Foucault, Lacan et la question de l’éthique, Paris, PUF, 1995, O. Bonis 불역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는 한국어로 “자기의 통치와 타자의 통치”이며, Le Courage de la vérité는 한국어로 “진실의 용기”이고 이것이 “자기의 통치와 타자의 통치” 2권이다. Discours et vérité의 국역본으로는, “담론과 진실”,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동녘, 2017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나의 글 “La philosophie et l’actualité: au-delà de l’événement?”, in Patrice Maniglier(dir.), Le Moment philosophique des années 1960 en France, Paris, PUF, 2011을 보라. [본문으로]
- Dits et Écrits II, 1970-1975, Paris, Gallimard, 1994 p. 571. [본문으로]
- [옮긴이] 일반적으로 cours나 leçon은 ‘강의’로 옮기고, 이 ‘강의’를 구성하는 séance는 ‘회차’로 옮긴다. 만일 푸코의 강의가 1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이 ‘회’가 바로 séance이다. [본문으로]
- 오늘 우리는 뤼디 레오넬리의 박사학위논문의 3부가 이탈리아어로 출간된 덕분에 이 문제에 관한 완전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Rudy Leonelli, Illuminismo e Critica. Foucault interprete di Kant, 에티엔 발리바르 서문, Macerata, Quodlibet Studio editore, 2017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극화하기’(Dramatiser)는 거의 확실히 들뢰즈를 매개로 하여 푸코 자신이 니체로부터 빌려오는 그러한 범주이다. 들뢰즈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하라. “La méthode de dramatisation”(conférence à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1967), in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es, David Lapoujade(éd.), Paris, Minuit, 2002, p. 131 이하. [본문으로]
- [옮긴이] 국역본으로는, “라모의 조카”, 드니 디드로 지음, 황현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출판되지는 못했던 책에 푸코가 붙인 유명한 서문인 ‘Vies des hommes infâmes’, in Dits et Écrits III, 1976-1979, Paris, Gallimard, 1994, pp. 237-253를 보라. 또한 Moi, Pierre Rivière, ayant égorgé ma mère, ma sœuer et mon frère… Un cas de parricide au XIXe siècle, 미셸 푸코 서문, Paris, Gallimard/Julliard, 1973도 참조하라(이 책의 국역본으로는, “나, 피에르 리비에르: 내 어머니와 누이와 남동생…을 죽인”, 미셸 푸코 지음, 심세광 옮김, 앨피, 2008을 참조하라 - 옮긴이). [본문으로]
- Michel Foucault, “Enquête sur les prisons: brisons les barreaux du silence”, in Dits et Écrits II, op. cit., p. 176을 참조하라. 감옥정보집단이 생산한 문서들은 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Archives d’une lutte, 1970-1972, Philippe Artières, Laurent Quéro, Michelle Zancarini-Fournel이 문서를 취합하고 소개, 다니엘 드페르(Daniel Defert)의 후기, Paris, IMEC, 2003으로 소개, 출판되었다. [본문으로]
- [옮긴이] 이 글에는 ‘봉기’와 ‘저항’을 뜻하는 여러 프랑스어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원어를 병기해서 구분해주도록 한다. [본문으로]
- 우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실행했던 이 반체제적 저항자들에 대한 감금의 방식을 통해 이 소비에트의 반체제적 저항자들과 나머지 인물들(즉 수감자들과 광인들 - 옮긴이) 사이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금의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레오니드 플리우슈츠(Leonid Pliouchtch)인데, 일군의 수학자들, 특히 프랑스의 수학자들의 지지 덕분에 플리우슈츠의 경우가 가장 잘 알려질 수 있었으며, 푸코 또한 플리우슈츠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Michel Foucault, “Crimes et châtiments en U.R.S.S. et ailleurs…”, K. S. Karol과의 대담(1976), in Dits et Écrits III, n. 172, op. cit., p. 63 이하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지난 5월 우리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 옮긴이) 바스티유를 취(pris)했듯이 말을 취했다(pris la parole).”, in Michel de Certeau, La Prise de parole et autres écrits politiques, Paris, Le Seuil, 1994. [본문으로]
- [옮긴이] 이미 위에서 한 차례 등장한 바 있던 se dresser는 ‘맞서 저항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숙어이다.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는 s’autorisant de lui-même을 옮긴 것으로,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합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발언한다는 의미이다. se lever와 se dresser의 경우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모두 원어를 병기해준다. 그리고 soulèvement이라는 단어 자체가 sous + lever 즉 ‘아래에서 위로 일어선다’를 뜻한다. [본문으로]
- [옮긴이] 발리바르에 따르면, 이 어구의 불어 번역은 activité de tous et de chacun이며, 한국어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각자의 활동’이다. [본문으로]
- 이란 혁명에 대한 푸코의 입장과 해석에 관한 두 가지 반정립적 해석들로는, Janet Afary & Kevin B. Anderson, Foucault and the Iranian Revolution. Gender and the Seductions of Islam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와 Behrooz Tamari-Ghabrizi, Foucault in Iran. Islamic Revolution after the Enlighten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을 참조하라. 또한 버나드 하코트(Bernard Harcourt)가 지도했으며 다니엘 드페르가 참석했던 2017년 12월 14일의 컬럼비아 대학 Uprisings 13/13의 세미나 “Foucault en Iran”에서의 토론에 제출된 발제문들 전체도 참조하라. blogs.law.columbia.edu/uprising1313/6-13/. [본문으로]
- [옮긴이] ‘여행가방 운반자들’은 porteurs de valises를 옮긴 것으로, 이는 알제리 전쟁 당시 여행자로 위장해 알제리의 해방투쟁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 투사들을 부르는 별칭이다. [본문으로]
- Étienne Balibar, “Blanchot l’insoumis”, in Citoyen sujet et autres essais d’anthropologie philosophique, Paris, PUF, 2011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Maurice Blanchot, “L’insurrection, la folie d’écrire”, in L’Entretien infini, Paris, Gallimard, 1969, p. 342. [본문으로]
- Michel Foucault, Discours et vérité(La Parrêsia 수록), Henri-Paul Fruchaud & Daniele Lorenzini (éd.), 프레데릭 그로(Frédéric Gros) 서문, Vrin, 2016, p. 23, p. 79. 푸코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에서는, 지나가면서만 이 지점을 상기시킨다. [본문으로]
- [옮긴이] dire-vrai는 ‘진실-말하기’로 옮기는 것이 올바르고 자연스럽지만, 옮긴이는 vérité와 vrai를 구분해주고 싶어서 부자연스럽더라도 ‘참-말하기’로 옮기도록 한다. [본문으로]
- 예를 들어, (저서 L’Impossible Prison에 관한) 1978년 5월 20일자 “원탁 회의”(Table ronde)를 참조하라(in Dits et Érits IV, 1980-1988, Paris, Gallimard, 1994, p. 20 이하). 또한 “La vérité et les formes juridiques”, in Dits et Écrits II, op. cit와 Mal faire, dire vrai. Fonction de l’aveu en justice, Cours de Louvain, Fabienne Brion & Bernard E. Harcourt (éds), 1981, Chicago-Louva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2012도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푸코가 만든 조어인 alèthurgie는 한국어로 보통 ‘진리의 현시’로 번역되며, ‘진리’를 뜻하는 알레테이아(aletheia)와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는 에르곤(ergon)이 합쳐진, 혹은 알레테이아와 ‘(공적) 의무나 의례’를 뜻하는 리투르지아(liturgia)가 합쳐진 용어이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죄송하게도 옮긴이가 이 용어에 대해 아직은 연구가 부족해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본문으로]
- [옮긴이] 어쩔 수 없이 ‘축복’으로만 옮겼으나 이 bénédiction 또한 ‘딕시옹’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주장’ 즉 prétendre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장한다’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이다. 이 단어를 통해 발리바르는 과학적 진실확인이 객관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과학적 진실확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은, ‘지각’(Die Wahrnehmung)에 할애된 장을 시작하면서, 이 ‘지각’의 독일어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단다. “Ich nehme so es auf, wie es in Wahrheit ist, und statt ein Unmittelbares zu wissen, nehme ich es wahr”(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Johannes Hoffmeister (éd.), Hambourg, Felix Meiner Verlag, 1952, p. 89). 장 이폴리트(Jean Hyppolite)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나는 이를(= 대상 - 발리바르) 진실 내에 있는(en vérité, 진실인) 것처럼 취하며(prends), 하나의 비매개적인 것/직접적인 것un immédiat(나는 이를 진실 내에 있는en vérité 것으로 취한다)을 아는(savoir) 대신에, 나는 이를 지각한다.” 장-피에르 르페브르(Jean-Pierre Lefebvre)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나는 이를 진실 내에 있는(en vérité, 진실인) 것 그 자체로 취하고 수용하며(reçois), 비매개적인/직접적인 무언가를 아는 대신에, 나는 그 진실 안에서(dans) 취한다, 나는 지각한다.” 그리고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인다. “Nehme ich wahr. 여기에서 헤겔은, 지각(perception)의 ‘알기’(savoir)의 활동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지각하기’(percevoir)의 프랑스어 등가어의 구성요소들보다 지각의 ‘알기’의 지위를 더욱 강조하는 wahrnehmen이라는 동사의 어원적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말놀이를 한다. 우리는, 타인이 지각하는 바와의 이러한 ‘동일성’(identité)이 지각된 바의 보편적 특징을 정초하는 한에서, 이를 ‘참인 것으로 동일시[확인]하다’(identifier comme vrai)로 번역해볼 수도 있다.”(Hegel, Phénoménologie de l’esprit, 장-피에르 르페브르의 불역과 소개, Paris, GF-Flammarion, 2012, p. 140.) [본문으로]
- 동시대 프랑스 철학 내에서 ‘진실의 역사’라는 어구가 취하는 의미에 관해서는, cf. Étienne Balibar, ““Histoire de la vérité”. Alain Badiou dans la philosophie française””, in Charles Ramond(éd.), Alain Badiou. Penser le multiple, Paris, L’Harmattan, 2002와 “L’histoire de l’Église doit être proprement appelée l’histoire de la vérité”, in Laurent Bove, Gérard Bras, Éric Méchoulan(dir.), Pascal et Spinoza. Pensée du contraste, Paris, Amsterdam, 2007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대항-품행’이라는 주제는 ‘통치’라는 통념과 상관적이다(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1978년 3월 1일의 강의, Paris, Le Seuil/Gallimard, 2004, p. 195 이하). Philippe Artières & Mathieu Potte-Bonneville, D’après Foucault. Gestes, Luttes, Programmes, Paris, Les Prairies ordinaires, 2007 또한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전자의 국역본으로는, “안전, 영토, 인구”,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최근 출간된 프랑스어 “섹슈얼리티의 역사” 4권의 뒷표지에도 이 시구가 실려있다. 한국어 번역본 뒷표지에는 실려있지 않다. [본문으로]
- René Char, L’Âge cassant. 이에 대한 장-클로드 밀네르(Jean-Claude Milner)의 다음과 같은 주석을 참조하라. “Michel Foucault ou le devoir aux rives du temps”, in La Règle du Jeu, n. 28, 2005년 4월. [본문으로]
- Op. cit. [본문으로]
- [옮긴이] 그 내용에 맞게 이 소제목을 조금 의역하자면, ‘두 가지 대립선들이 형성하는 하나의 체계와 그 도주선’이다. [본문으로]
- “Préface à la transgression”(1963), in Dits et Écrits I, n. 13, op. cit., p. 233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 1983년 1월 12일의 강의, in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op. cit. [본문으로]
- 1984년 3월 21일의 강의, in Le Courage de la vérité, op. cit. [본문으로]
- 푸코는 클레온을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op. cit., p. 99에서 인용한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점검’은 examiner를 옮긴 것으로, 독자들은 영어 examine이라는 동사의 뉘앙스를 떠올리면서 이를 ‘성찰’의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 단어에는 ‘점검’, ‘검진’, ‘진찰’, ‘분석’, ‘검토’ 등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러한 성찰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 경우, 이와 달리 일반적 의미인 ‘검토’로 옮겼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냉소적’은 sadonique을 옮긴 것인데, 사실 ‘견유주의’의 원어 cynique에는 ‘냉소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서로 공명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sadonique에는 ‘조롱하는’과 ‘성가시게 하는’의 의미 또한 들어있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표상’은 représentés를 옮긴 것으로, ‘재현’, ‘상연’, ‘대표’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본문으로]
- 내가 여기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입장은 예일대학교에서의 콜로퀴엄인 “Foucault: After 1984”에서 쥐디트 르벨(Judith Revel)이 제시했던 것이다. [본문으로]
- 이미 알다시피,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cosmopolitès)이라고 불렀는데, 많은 해석가들은 이를 규정된 하나의 도시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도시의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푸코는,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사이의 역사-신화적인 그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와) 세계의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보편적 주권과 ‘비참(misère)의 왕’인 디오게네스의 반(anti)-주권성(혹은 비밀스런 주권성)을 정면으로 대립시킨 뒤, ‘코스모폴리티즘’(cosmopolitis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신 견유주의적인 것의 비정치성(impolitique)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politheuesthai를 아래로부터 요구된 ‘우주적/세계적(univers) 통치’로 묘사한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되곤 하는 관습들’은 les conventions bien-pensantes를 옮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bien-pensant이라는 형용사는 ‘그 당시의 관례에 잘 맞게 혹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예의바른’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 울타리부터 벗어나도록 만들다’는 faire sortir de sa réserve라는 숙어를 옮긴 것인데, 이는 자기의 고립된 영역 바깥으로 나오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며, 결국 화가 나도록 만들거나 도발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발리바르는 디오게네스가 수행하는 ‘도발’을 이 숙어가 지니는 ‘도발’이라는 뉘앙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 푸코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실의 추문’이라는 표현을 다시 취한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진실의 추문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적인 배경을 지니는 것일 수 있다(바오로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선교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추문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의 광기”라고 말했다)(고린도 전서 1장 23절). 하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 진실의 추문이라는 표현은 뮌헨 조약 이후에 샤를 모라스(Chalres Maurras)로 대표되는 프랑스 정치계급에 대항하는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1939년 팜플렛 “진실의 추문”(Scandale de la vérité)으로부터 온 표현이다. 이 팜플렛에서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 “추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전체를 말하지는 않으면서 어떠한 누락을 통해 이 진실에 하나의 거짓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누락은, 진실을 바깥으로부터는 손상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만, 마치 암처럼 진실의 내부에서부터 그 심장과 내장을 갉아먹는다(…).”(Paris, Gallimard, 1939, p. 56) 복음서적 배경과 베르나노스의 팜플렛 사이의 매개자는 아마도 파스칼의 “시골친구에게 보내는 편지”(Provinciales)일 것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초인’은 프랑스어 surhomme을 옮긴 것으로, 이는 니체의 ‘위버멘쉬’(Übermensch)의 프랑스어 번역어이다. [본문으로]
- 우리는 이러한 대립들의 지형에 대한 도식화를 다음과 같이 시도해볼 수 있는데, 이 도식화에서 견유주의자(디오게네스)는 제대로 이해된 구조주의 내에서라면 ‘빈칸’을,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기의(혹은 동일성)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유하는 기표라는 빈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도식 (1)/ 논리적으로 보자면, 견유주의는 정직한 정치(politique droite)에 대한 일종의 ‘이중 부정’이며, 철학과 인민선동(혹은 소피스트적인 것la sophistique?)은 다음과 같이 그 단순부정들 혹은 부분부정들이다. /도식 (2)/ [본문으로]
- [옮긴이] 구조주의에서의 ‘빈칸’ 개념에 대해서는,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질 들뢰즈 지음, 박정태 옮김, 이학사, 2007에 실린 들뢰즈의 논문 ‘구조주의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Rudy Leonelli, Illuminismo e critica…, op. cit.을, 특히 그 6장인 “Le critiche di Habermas: un altro concetto di tradizione”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푸코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지식인들의 궤적들과 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예를 들어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말이다…. 사이드가 BBC 라디오의 “The Reith Lectures”에서 행한 강연을 책으로 출판한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Pantheon Books, 1994를 보라(이 책의 한 장의 제목은 명시적으로 푸코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Speaking Truth to Power”이다). 또한 독자들은 이에 관해 집필한 나의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Speak Truth to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Thought, R. Radhakrishnan이 편집한 같은 제목의 특집호, 2014년 겨울. (사이드 책의 국역본으로는, “지식인의 표상”,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 마티, 2012를 참조하라 - 옮긴이) [본문으로]
- [옮긴이] 알다시피 pragmatique에는 ‘화용론’이라는 의미와 ‘실용주의’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 옮긴이의 과잉해석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실용주의’라는 의미가 꼭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참고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발리바르는 pragmatique과 dramatique을 통해 어떠한 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본문으로]
- Michel Foucault,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op. cit., p. 49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1983년 2월 2일과 9일의 강의들, in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op. cit.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좋은 정치’는 bonne politique을, 이미 앞서 등장한 바 있는 ‘정직한 정치’는 politique droite를 옮긴 것으로, 이는 ‘정치한 정치’로도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으로]
- 푸코가, 자신보다 몇 십년 전에 장-피에르 베르낭(Jean-Pierre Vernant)이 모두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평등하게 시민들이 자신들의 동료 시민들에게 말을 건내러/연설을 행하러adresser la parole(en mesôi) 와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혹은 빈 자리)이라는 형상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 도시와 민주주의의 기원들에 대한 당대 논쟁의 흐름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했던 그러한 방식과는 대립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전면에 나서기’와 ‘지배력’에 관한 연극적 묘사(dramaturgie)를 강조했다는 점은 나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Jean-Pierre Vernant, Les Origines de la pensée grecque, Paris, PUF, 1962와 “Géométrie et astronomie sphérique dans la première cosmologie grecque”, La Pensée, n. 109, 1963(Mythe et pensée chez les Grecs, Paris, Maspero, 1965에 다시 실림)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베르낭 저서의 국역본으로는,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장-피에르 베르낭 지음, 박희영 옮김, 아카넷, 2005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당연히 이 ‘덕’은 마키아벨리 식으로 말하면 ‘비르투’이다. [본문으로]
- 여기에서 나는 입문과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쥐디트 르벨이 크레테이유 대학에서 행한 자신의 발표에서 제안한 용어인 ‘개시’(inauguration)를 사용하고 싶다. [본문으로]
- [옮긴이] 간단히 ‘저자’로 옮겼으나 사실 auteur는 ‘행위의 귀속자로서의 책임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다. 또한 ‘저자-기능’은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텍스트에서 푸코 자신이 제시하는 관념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투여되는’은 investi를 옮긴 것인데, 여기에서 이는 ‘책임을 떠맡게 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선출되는’ 즉 électif와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어휘이다. 프랑스 정치제도 내에서의 ‘공천’ 혹은 ‘지명’을 의미하는 investiture라는 명사의 동사형이 바로 investir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créer pour soi-même을 옮긴 것이다. [본문으로]
- 그렇지만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없이, 하지만 이 파레시아와 동일한 모델을 다시 취하면서) 비극에서 차용한 ‘여성적인’ 파레시아적 품행에 대한 푸코의 언급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에서의 크레우스라는 형상이다(cf. Adriana Sforzini, “Dramatiques de la vérité: la parrêsia à travers la tragédie attique”, in D. Lorenzini, A. Revel & A. Sforzini(dir.), Michel Foucault: éthique et vérité 1980-1984, Paris, Vrin, 2013, p. 151 이하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se souciait de 즉 그 원형 se soucier de에서 soucier의 명사형 souci가 바로 ‘자기의 배려’(souci de soi)에서 ‘배려’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집요하게 존재하는’은 동사 insister를 의역한 것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여기에서 ‘경향지어져’는 ‘경향을 지니다’의 의미를 지니는 disposer à라는 숙어를 옮긴 것이다. [본문으로]
- [옮긴이] 일상 프랑스어에서 autorisation은 ‘허가’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함’ 혹은 ‘그럼으로써 스스로에게 허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서 등장했던 회합에서 자신에게 발언권을 스스로 허가하는 것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된다. [본문으로]
- [옮긴이] ‘무력화’는 neutralisée를 옮긴 것이고, ‘본성이 훼손됨’은 dénaturée를 옮긴 것이다. [본문으로]
- Emmanuel Kant, Critique de la raison pure의 서문(1781), in Œuvres philosophiques, I,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총서, 1980, p. 764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옮긴이] 진공 속에서라면 날개짓 없이도, 그러니까 그 어떠한 노력 없이도, 공기 속에서보다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손쉽게 날 수 있을거라는 비둘기의 착각을 비꼬는 칸트의 말이다. 여기에서 ‘진공 속’이란 발리바르에게는 ‘대항-권력이 없는 비정치적인 순수 상태’ 정도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인-무브 연재완료 > 발리바르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사유물론 5연구』 한국어판 서문 (0) | 2019.11.10 |
|---|---|
| 관개체적인 것의 철학들 : 스피노자, 마르크스, 프로이트 (0) | 2019.09.12 |
| 인간학적 차이의 정치철학: 브뤼노 카르젠티와의 대담 (0) | 2019.09.10 |
| 『대중, 계급, 사상』 서문 (0) | 2019.08.17 |
| 추측과 정세 : 에티엔 발리바르와의 인터뷰 (0) |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