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서의 자연: 가능한 것들의 유혹
저자: 디디에 드베즈(Didier Debaise)
영어 번역: 마이클 헤일우드(Michael Halewood)
한글 번역: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2장 보편적 마니에리슴 A Universal Mannerism
화이트헤드가 『자연의 개념』에서 제시한 사건 이론은 이분화를 국지적으로 넘어서도록 해줄 뿐이다. 이게 (사건 이론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다. 직접적인 지각 경험에만 고착하여 그를 토대로 자연 개념을 재구성하기로 한 그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사건 이론은 실재적인 것, 사건들 사이의 관계, 자연 속 실존 양태들의 다원성, 심지어 지식의 원천들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심각한 건 사건 이론이 오직 이분화의 한 갈래, 즉 제2성질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분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화이트헤드는 이후에 『자연의 개념』에서 발전시킨 사건 이론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현상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형이상학적인 새로운 수준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자연의 개념』이 다루기를 거부했던 그러한 모든 질문을 온전히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각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들의 실존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관계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자연 질서의 다원성을 구성하고 물리학, 생물학, 인간학(anthropology)의 영역들 내에서 자신을 특징지을 수 있는가?
나는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그 완전한 사변적 범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명제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 명제는 화이트헤드가 그의 대작 『과정과 실재』에서 처음 정식화한 것이다. “주체들의 경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오직 텅 빈 무(無)가 있을 뿐이다.”[1] 이건 화이트헤드에게서는 다소 낯선 진술인데, 매우 이례적인 문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모두 그러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엔 급진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그 단호한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화이트헤드가 이러한 선언을 할 때 자신이 새로운 사유를, 즉 현대 철학 분야에서 전환점을 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믿게 한다.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 시절부터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고 주요한 행위자 중 한 명이었던 철학 운동들과의 단절을 표현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왜 그가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진술을 제시했겠는가?
그러나 이 명제는 화이트헤드가 예상했던 만큼의 충격을 주진 못했다. 화이트헤드의 독자 대부분은 이 명제에 주목했더라도 그리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 달리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다소 낡은 철학적 질문, 즉 주체성 문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과정과 실재』의 첫 페이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접근(이 책의 부제가 ‘우주론에 대한 에세이’이고 첫 장의 제목이 「사변 철학」이다), 주체의 변화에 관한 그 어떤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 과정 개념의 중요성, 모든 형태의 실체주의(substantialism)에 대한 되풀이되는 끈질긴 비판(그 중요성은 과학적 유물론에 대한 이전 논의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헤드가 철학에 부여하는 기능, 즉 자연 내 서로 다른 실존 양태들의 “집합체(assemblage)”라는 기능까지 화이트헤드 철학의 모든 것이 그러한 부활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가 어떻게 가장 급진적으로 반(反)주체주의적인 자신의 작업에서 주체성 개념으로의 회귀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주체성을 자연에서의 경험의 특유한(particular) 영역으로 다루는 제한적인 질문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만일 그랬다면,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에서 다루는 시공간의 구성, 물리적 존재와 생물학적 존재의 차이, 실재의 궁극적 구성 요소 간의 내적 및 외적 관계들과 같은 고전적인 우주론적 질문들 옆에 나란히 주체성을 위한 자리를 남겨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화이트헤드가 공언한 우주론적 기획의 전체적인 일관성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이 명제는 훨씬 더 나아갔으며, 『과정과 실재』에 특유한 전문적인 문체에 익숙한 독자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체성에 그러한 자리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그의 기획이 지닌 우주론적 야망 안에 새겨져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잘못된 대안이 생겨났다. 즉, 주체성의 문제가 국지적인 것이라거나(비록 화이트헤드 진술의 단호한 특성은 분명히 이 방향을 지시하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이 새로운 우주론의 바로 그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더 심오한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무엇일까?
그 결과, 이 명제는 잠복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나는 이 명제에 더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여 주체들을 위한 형이상학적 경첩(hinge)으로 삼을 것이며, 화이트헤드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주요 개념들을 동원해 그것을 공고히 할 것이다. 오늘날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화이트헤드 해석의 한 지점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화이트헤드의 몇몇 중요한 독자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그들의 불충분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명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명제에 수반되는 불편함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나의 목적은 화이트헤드의 저술들에 대한 독해를 판단하거나,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동기는 지난 장에서 부분적으로 개괄했듯이 다른 데 있다. 만약 이분화가 근대인들의 우주론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안은 분리되어 지나치게 특수하고 협소한 영역에 국한되었던 경험의 모든 요소를 재분배할 때만 정합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제1성질과 제2성질이 멀찍이 분리되는 대신, 다르게 절합되어 모든 존재의 내적 측면들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장 넓은 의미의 모든 제2성질 – 즉 색깔, 소리, 미적 색조(tones), 중요성의 계조(階調, gradations), 가치, 목적 - 이 동등한 기초 위에서 존재 자체 내로 도입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연 경험을 갖게 될까? 우리의 현대적 경험은 경험의 중심, 존재 양식, 실존하는 것들이 서로 맺는 다중 관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원적으로 되는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 순수한 인간학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도록 강요하지 않는가? 윌리엄 제임스를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 등급의 복잡성을 띠거나, 인간뿐만 아니라 초인간(superhuman)이거나 저인간(infrahuman)일 수 있는) 개별적인(personal) 삶”으로 구성된, “서로를 다양하게 인지하고 […], 노력과 시도를 통해 진정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며, 그들의 상호작용과 누적된 성취들로 세계를 만드는”[2] 자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주체성의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불릴 화이트헤드의 명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명제는 경험을 하는 양식들의 다수성, 진정한 범경험주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변적 도식의 구성에서 첫 번째 원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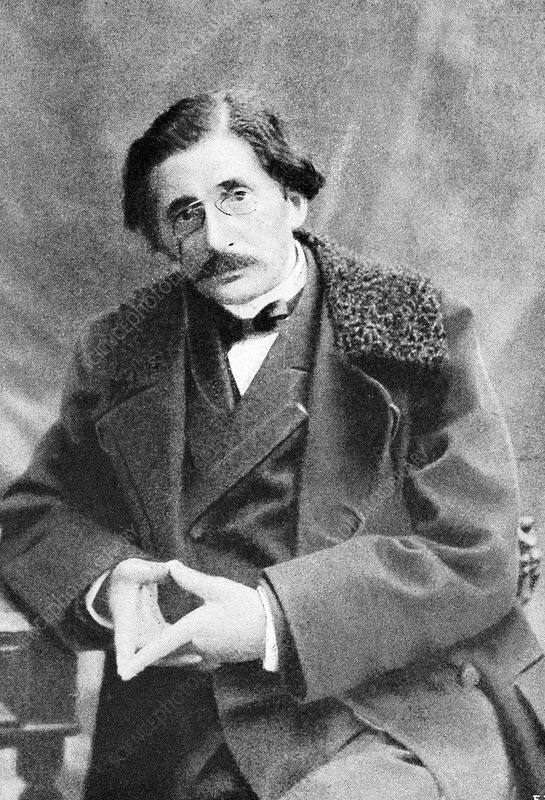
주체성의 형이상학적 원리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명제에 관한 화이트헤드의 저술들을 세심하게 대하는 독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현대 철학의 맥락이 뒷받침하는 주된 인상은 주체성이라는 물음이,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단절해야 했던 인간학적 주체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의도성, 정신, 표상 역량과 같은 범주들을 동원하는데, 이를 주로 인간 역량 이론과 연결한다. 그리하여 더 일반적인 형이상학의 기초가 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 혹은 그 개념은 모든 특성이 비워져서, 쉽게 제외될 수 있는 빈 껍데기가 된다. 따라서 주체성의 형이상학적 원리는 이중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에게 속해야 하며, 즉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합적이어야 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이중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중심적인 구성 요소를 주체성 개념에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느낌(feeling)이다. 이 개념이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수반되는 함의와 변형을 살펴보기 전에, 나중에 그 의미가 명확해질 특정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용법을 먼저 고찰할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느낌”이라는 단어를 명사와 동사로 모두 사용하며, 이러한 용법들 사이의 모호함(ambiguity)을 유지한다. 따라서 그는 “감각(sensation)”, 일반적인 느낌, 기분,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막연한 알아차림, 즉 정동적 색조들(affective tonalities) 그리고 무언가가 제대로 느껴지는 행위나 작용에 관해 얘기한다.[3] 화이트헤드는 “느낌”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유지하는데, 이는 그가 그 두 측면을 융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감각과 인상을 한쪽에 두고, 그것들이 경험되는 양식과 색조를 다른 쪽에 두는 것은 순수한 허구일 것이다. 동물이 위험을 “느낄” 때, 곧 경계할 때, 과연 우리는 그 개별적 인상들을 위험함에 대한 막연한 느낌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그 막연한 느낌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게 위험의 표현이 되는 데 말이다. 각 인상은 상황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느낌에 따라 고유하고 특별한 색조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더 일반적인 감각은 진행 중인 행동, 즉 다른 기회들에 대한 “알아차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의 실재적 양상(modality)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일상 용법에서조차 “느낌”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즉 감각과 인상들, 경험의 양상들과 그것들이 전달하는 여건이 하나로 합쳐진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화이트헤드는 “느낌” 개념의 원천을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찾는다. “이 책(『과정과 실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라는 단어는 데카르트를 한층 더 연상케 한다.”[4] 위에서 열거된 모호함들, 특히 주체성 개념이 인간학적 기획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다는 모호함을 종식하거나 최소한 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인용문은 다소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화이트헤드가 모든 것이 느낌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말할 때, 그는 정확히 어떤 유산에 의지하는 걸까? 데카르트는 느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해당 구절은 「제2성찰」에 있으며, 외양(appearances)과 관련이 있다. “나는 느끼는 자, 즉 마치 감각 기관을 통하듯 특정 사물들을 지각하는 자이다. 진정으로 나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열을 느낀다. 그러나 이 현상들이 거짓이며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열을 느낀다고,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거짓일 수 없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느낌(feeling; sentire)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렇게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사유함(thinking)과 다름없다.”[5]
화이트헤드는 이 구절에 대해 간략한 논평만 제공한다. 그는 “데카르트의 언어로 말하자면, 현실적 존재(주체)의 본질은 오로지 그것이 파악하는(느끼는) 사물이라는 사실에 있다”[6]고 썼다. 이제 데카르트가 말하는 바를 두고 가능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느낌에 대한 이러한 사유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데카르트는 느낌의 행위(act of feeling)의 확실성을 개괄한다. 단순한 외양이나 망상에 관해서는 모든 게 환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착각일 수가 없다. 그것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매 찰나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의 실재성을 긍정하며, 그걸 뒷받침하는 사물의 실재성에 관한 입장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 자신의 실존 안에서 발생한다. 열의 원천과 시각적 인상이 발산되는 대상들이 환영에 불과한 것, 순수한 환상이나 투사일 수 있다. 하지만 느낌의 행위를 논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실재적이며 자신의 활동 외에 다른 정당화가 필요치 않다. 둘째, 데카르트는 느낌을 매우 넓은 평면에 놓는다. 빛을 보는 것, 소리를 듣는 것, 열을 감지하는 것부터 느낌과 사고의 최종적인 동일시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출처 자체가 모호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데카르트는 느낌의 행위를 사고 자체와 동일시한다. 화이트헤드가 궁극적으로 느낌의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이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동일시의 가능성은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며, 그렇기에 주목할 만하다. 이 예상치 못한 연관성에서 중요한 점은 화이트헤드가 느낌을 주체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주체의 실재성이 활동 자체에 있는 지속적인 활동성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이제 이 물음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데카르트의 예시는 느낌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잘 보여주지만, 너무 제한적이다. 실제로 이 예는 특정한 경우, 즉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인 자신의 자원들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자극하는 작용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열에 대한 감각과 같이 자신을 자극하는 느낌의 활동들을 강화하여, 마침내 그러한 느낌들이 “사유함(thinking)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식적 주체다. 이 예시를 덜 예외적이고 덜 인위적인 상황, 예를 들어 완전히 습관적인 행동이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만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듀이의 보행자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느낌에 관한 질문은 데카르트의 예시 속 주체의 모든 특징에, 즉 감각 경험뿐만 아니라 꿈의 반사 작용,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경험들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체의 모든 측면이 느낌의 논리에 의존하게 된다. 더욱이 다른 질서의 실재들, 예컨대 미생물과 원시적인 생명 형태들에서도 직접적으로 동등한 경험을 발견할 순 없을까? 데카르트의 인위적인 예시 제시 방식을 제외한다면, 그가 느낌에 대해 말하는 바를 모든 형태의 생명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느낌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를 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 즉 모든 형태의 생명으로의 일반화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 심지어 유기체의 낮은 형태에 있는 식물조차도 자기 보존을 지향하는 행동 양식을 보인다. 외부 세계와의 인과 관계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 질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되고 위치성(locality)과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정의되는 어떤 강도를 갖는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징후는 많이 있다.”[7]
데카르트적 주체는 다수의 경험 중추들과 다른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폭넓은 지각 양식들(시각, 청각, 촉각)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 특히 원시적인 생명 형태와 – 자신을 구별한다. 이러한 지각 양식들은 데카르트적 주체가 자신의 경험 영역을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손에서 “열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자와 미생물, 그리고 식물 사이의 차이는 느낌의 현존이냐 부재냐(그들은 모두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위치시키고 변형시키는 능력에서의 차이다. “내 손에서 열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의 일차적인 증거라기보다는, 경험의 능력들이 분화된(differentiated) 진화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식물과 미생물에게 뚜렷한 지각이 부재한다고 해서 모든 느낌의 부재를 암시하는 건 아니다. 그 느낌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국한된 이 열기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흐릿한” 느낌이다.
화이트헤드는 느낌의 유비들(analogies)을 식별할 수 있는 실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시를 든다. “꽃은 인간 존재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빛을 향해 몸을 돌리며 (...) 개는 인간만큼이나 확실하게 직접적인 미래가 자신의 현재 활동에 순응하리라 예상한다. 개는 계산과 간접 추론을 하는 데 실패하지만, 결코 직접적인 미래가 현재와 무관한 것인 양 행동하지는 않는다.”[8] 식물은 자신들의 변형을 일으키는 빛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진술하고 가리키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지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식물이 빛을 향해 몸을 돌릴 때, 의심할 여지 없이 환경 변화에 대한 느낌이 관여한다.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빛의 원천이 완전한 환상, 즉 키메라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의 활동은 그만의 고유한 실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다. 비록 매우 분산된 양식(diffuse manner)일지라도 무언가가 느껴진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반하여, 데카르트의 이 구절은 느낌을 주체의 경험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끊임없는 활동으로서 사고하는 걸 가능케 했다. 이것은 느낌의 형이상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실존의 공간을 확정하고 데카르트의 예시가 제한하였던 경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낌의 형태가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데카르트적 사유자와 식물 또는 미생물 모두에 관련된다고 묘사된, 이 느낌의 활동은 정확히 무엇인가? 앞선 화이트헤드의 인용문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식물, 개, 또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순응의 감각(sense of co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경험 양식들 아래에서 공통된 활동을 찾아낸다. 이것이 느낌의 원초적 형식을 구성한다.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예들에서 그것은 방식들의 다수성을 표현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현재에 순응하리라 예상하는 것, 현재가 직접적인 과거에 의해 조정되는 것,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사건들의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다.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자연의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는 “동물적 믿음(animal faith)”[9]에 대해 말한다. 이는 일종의 최소한의 믿음 - 만약 이 용어가 이미 너무 복잡한 경험 양식을 함의하지 않는다면, 거의 “생리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으로서 현재의 사건들이 직접적인 과거에 순응하고 미래가 자연의 지배적인 경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이 일치감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 형태들에 위치할 때 실재적 단순성을 지닌다. 화이트헤드가 위에서 인용한 구절의 끝부분에 썼듯이, “개는 결코 직접적인 미래가 현재와 무관한 것인 양 행동하지는 않는다.”[10] 이는 회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겹쳐져 하나의 운동을 형성하는 시간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에서 핵심적인 측면이다. 이 운동의 돌발(irruptions)은 능동적으로 뚫고 나타나는 실재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모두 연결된다. 이러한 “순응의 감각”, 즉 느낌의 일차적 측면은 무엇보다도 시간 감각(sense of time)이다. “계기(succession, 繼起)는 순수한 계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태에서 사태로의 파생(derivation)으로, 선행하는 것에 대한 후행하는 상태의 순응성(conformity)을 드러내어 준다. 구체적인 것에서의 시간(Time in the concrete)은 사태가 사태에 순응하는 것, 뒤따르는 것이 앞서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계기는 확정된 과거에서 파생하는 현재로의 비가역적 관계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11]
화이트헤드가 순응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기계적인 것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그것은 과거에 현재가 순응하는 양식에 관해서 전혀 결정론적이지 않다.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예들에서, 이 살아있는 활동을 이전 사건들에 의해 조건(terms)을 제공받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실행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식물이 빛을 향해 몸을 돌릴 때, 그것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직접적인 과거의 사건들, 특히 현재 경험에 남아있는 빛줄기들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나 식물의 이전 상태가 현재 작용(action)을 일방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항상 시작해야 하는 것은 순응 활동(activity), 즉 현재에서의 활동이다. 바로 이것이 계승될 것을 정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의 이러한 국지적 수용과 예상되는 사건들을 정의한다.
이는 우리가 별개의 계열들이 있다고 가정한 다음 어떤 종류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것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입장과는 정반대다. 화이트헤드는 베르그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전의 계보를 확립하고, 그 견해를 착각이 아니라 과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간 특성들의 역전은 추상적인 찰나들의 불연속성이 경험의 연속성, 즉 순응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베르그손이 사유했듯이, 이러한 역전은 자연에 자신의 특성들을 실제로 투사하는 지성의 고유한 산물이 아니다. 이 역전은 더 유기적이고 근원적(primitive)이다. 그것은 유기체 내의 특정 찰나들, “인간 유기체의 어떤 근원적인 기능 작용(functioning)이 평소와 달리 강해지거나, 우리의 습관적인 감각-지각의 상당 부분이 평소와 달리 쇠약해질 때” 나타난다.[12]

사로잡음으로서의 존재
느낌은 과거를 통합하는 현재의 활동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파악(prehension)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느낌”과 “파악하다”라는 용어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후자는 느낌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의 윤곽을 보여준다. 이 용어는 본래 인지 활동, 즉 지식의 작용, “지성이 무언가를 붙잡는(seizing)” 행위에서 기원한다. 어떤 명제, 세계에 대한 정보, 사안들의 상태, 또는 이론을 정신이 통합하고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이러한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파악이 존재한다. 정신은 이전에는 자신에게 외재하는 것이었던 지식을 파악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전유(appropriate)한다. 나중에 이 용어는 인지적 지위를 계속 보유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가지는 행위(the action of taking), 특히 손으로 대상(객체)을 붙잡는 것, 법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것, 또는 무언가를 전유하는 것으로 변형된다. 나는 파악의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즉 무언가를 가져오고(가져가고), 붙잡거나 사로잡는(capture)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주름』 중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할애된 장에서 들뢰즈는 파악의 논리를 실존의 모든 수준에 적용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행하는 것들과 병존하는 것들을 파악하며, 차차 나아가 하나의 세계를 파악한다. 눈은 빛의 파악이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물, 흙, 탄소 그리고 소금을 파악한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피라미드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을 파악하며(4천 년이 제군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13]
파악하는 행위는 식물의 원시적인 생명 형태부터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미미한 지각들을 거쳐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새로운 실존 속에서, 새로운 느낌의 행위 속에서 과거의 존재들을 가져오고 사로잡는다. 마치 각 존재가 이중의 실존을 가지는 것과 같다. 하나는 그 자신의 관점, 즉 현재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실존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의 느낌 행위 속에서 획득되는 자기 존재의 실존이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그들의 행동들에서 자신들을 가능하게 한 앞선 역사(the prior history)를 전유하고, 그 후에 오는 세계(the world)에 의해 전유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소유(possession)[14], 사로잡음, 취함, 파악들에 대한 진정한 철학을 주창한다. 하나의 주체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짐(취득)이다(A subject is not a substance; it is a taking).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를 따라, “소유는 (...) 보편적인 사실”[15]이며, 만약 철학이 “동사 ‘갖다(Have; Avoir)’에 기반을 두었다면, 수많은 무의미한 논쟁들과 무익한 지적 노력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16]이고, “수천 년 동안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존재 방식과 존재의 상이한 정도를 분류해왔지만, 소유의 서로 다른 유형과 정도를 분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17]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순응에 대해 더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험의 연속성에 관한 이유를 어떤 기계론적인 프로그램 – 거기서는 지금의 행위들이 단지 찰나나 표현에 불과할 - 의 실현이 아니라 행해지는-중인-작용들(actions-in-the-making)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모든 것은 현재에서의 작용들에서 발현된다. 앞에서 든 예에서 꽃이 빛을 향해 몸을 돌린다고 말했을 때, 그건 꽃이 빛의 앞선 작용을 사로잡거나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빛이 꽃과 동시대적이며, 꽃의 반응이 빛줄기의 연속에 병행하여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입장이 채택된다면, 지나가고 있던 무언가를 사로잡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건 무의미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현재 사건들의 충격으로 간주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에 관해서도, 그것은 오로지 현재의 사물들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던 것들만 본다고 진술하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을까?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입장이 아니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입장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항상 파악되며 이 과거가 현재의 행위에 무한히 가깝다고 할지라도, 파악을 구성하는 사건들은 이 현재하는 행위보다 선행한다. 꽃은 방금 발생한 빛줄기를 파악하고, 우리는 방금 일어난 사건을 지각한다. 만약 이 빛줄기가 계속되고 우리가 지각하는 사건이 우리가 지각하는 거리만큼 연장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연속성은 느낌 행위들의 반복일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위상이 어긋나는 두 개의 평행한 행위 계열, 즉 빛의 파악 계열과 빛줄기의 반복 계열이 존재한다. 어떤 파악 행위든 그것은 선행 사건의 사로잡음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이 사건이 존속한다면 그것은 일련의 느낌 행위들 속에서 파악될 것이다. 따라서 각 행위의 내용은 과거 행위들로부터 제공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확실히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것(과거 행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정의하는 일)은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는 결정 중 일부다. 곧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사로잡는 행위다.
이제 느낌이 함의하는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미 제시한 예들과 느낌이 묘사된 방식이 필연적으로 이끄는 일련의 질문들로부터 시작해보자. 과거의 행위들이 항상 느껴지고 파악되며 사로잡힌다고 했을 때, 이건 얼마나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 그것은 어떤 느낌의 직접적인 과거를 형성하는 행위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점점 더 먼 과거까지 포함하는 걸까? 그 한계는 어디일까? 인접한 공간, 인접한 행위들 속에만 느낌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런 접촉이나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느낌들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특정 느낌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행위들을 현재 행위에 대해 사소하거나 하찮은 행위들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느낌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제시된 것에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다면, 답은 자명해진다. 느낌 행위 속에서 사로잡히는 전체 선조 우주(entire antecedent universe)이다.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자신의 철학의 궁극적인 원리로 삼는다. “이접적(disjunctively) 방식의 우주인 다자(the many)는 연접적(conjunctively) 방식의 우주인 하나의 현실적 계기가 된다.”[18] 또는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는 이접적으로 주어진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이다.”[19] 이 원리는 앞선 페이지들에서 제시된 어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새로운 느낌 행위는 우주를 이루는 이전 행위들의 다수성(이접적 다원성)의 사로잡음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느낌 행위 속에서 선행 우주는 총체성으로 느껴진다. 이는 특히 앞서 제시한 예들과 관련해 다소 과장된 명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연한 사유 행위에서, 시각적 지각에서, 미생물이 자신의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데서 항상 총체성 그 자체로서의 우주가 문제라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함축된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유하고 지각하거나 생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전체성 그 자체로서의 과거 우주가 하나의 단일한 행위, 즉 이 지각, 이 시각, 이 감각으로 응축되는 계기다. 이는 마치 우주가 수많은 경험의 중심들이자 실존하는 모든 것의 관점들인 다수성의 점들로 끊임없이 응축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관점들이 우주를 향한(에 대한) 관점들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들, 즉 우주에 내재하는 관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주의 궁극적인 재료를 형성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벡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는 이를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주체성의 형이상학적 원리는 모나드론적 기획(monadological project)을 재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라이프니츠를 따라, 각 느낌 행위, 또는 라이프니츠의 용어로는 지각이 모든 앞선 행위들이 반영되는 “전체로서 하나의 세계”[21]와 같다고 확언하는 문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행위들과 그 관계를 정의하는 예정 조화는 없으며, 어떤 느낌 행위도 제시된 한계, 즉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사물들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고찰할 때, 우리는 알렉산더의 영혼 속에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결과들이 항상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22]라고 썼을 때, 이는 그러한 느낌의 형이상학의 핵심에 위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그에 덧붙여 그 영혼 안에는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전조들, 심지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흔적들까지 발견된다. 하지만 오직 신만이 그것들 모두를 인식할 수 있다”[23]고 말하는 대목은 (느낌의 형이상학과) 상당히 다르다. 느낌에서 과거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 화이트헤드의 신모나드론적 명제와 라이프니츠의 표현 이론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 느낌의 활동은 항상 어떤 선행 사건들의 가짐이지만,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들뢰즈가 화이트헤드에 대해 말했듯이, “이분화들, 계열들의 분기들(발산들), 양립 불가능성, 불화는 잡다한 색깔로 칠해진 같은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 세계는 더 이상 표현하는 단위들 안에는 포함될 수 없고, 오직 파악하는 단위들과 가변적 배치들 또는 변화하는 사로잡음들에 따라서만 형성되거나 해체될 뿐이다.”[24]
이 감정 이론은 예외 없이 모든 선조 우주가 느낌이며, 각 사건이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다른 모든 걸 특징지을 흔적을 남긴다고 진술한다는 점에서 너무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눈에는 이러한 전례 없는 범위의 확장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여전히 느낌을 너무 많이 제한한다. 모든 우주가 느낌이며, 어떤 관점에 따라 사로잡히거나 소유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의 중요성의 조건이 될, 근본적인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 바로 느낌에 수반되는 모든 가능성의 흔적 말이다. “느낌은 그것이 탄생할 때 생긴 흉터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실존을 위한 자신의 투쟁을 주체적인 감정으로 상기한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의 인상을 간직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 존재가 느낌을 위한 여건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느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으로부터 단절된 단순한 사실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25]
어떠했을 수 있었던 것, 이미 이루어진 선택들, 그리고 일어나온 선정들이 느낌을 구성한다. 느낌은 “~할 수 있었던(~이었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의 효과적인 실존에 있어 피해야 했던 가능한 만일의 사태들, 자신에게 제시되었던 모든 대안을 수반한다. 특정 행위(action)에서의 망설임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이 구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가능성들은 하나의 특정한 경로를 위해 보류된 수많은 실존의 경로들을 형성한다. 설령 그 가능성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달성된 그 행동들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남는다. 따라서 모든 긍정적인 느낌, 모든 사로잡음은 언제나 가능성들을 회피, 부인, 거부하는 것에 대한 느낌들의 성좌를 동반하며, 이 점이 그들의 중요성을 증폭시킨다. 바로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현행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으로부터 단절된 단순한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썼을 때 의미했던 바다. 나는 이에 관해 사변적 명제들의 지위에 대한 후속 논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느낌과 연관된 가능 세계들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우발성, 선택에서의 망설임, 그리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거부가 남긴 흔적들은 실제로 실현된 행위들에서만 실재성을 가진다. 잠재적인 느낌에 대한 현행적인 느낌의, 힘(power, dunamis)에 대한 작용 활동(energeia)의 경험이 갖는 실재적 존재론적 우위가 있다. 화이트헤드의 명제는 실재적 현실주의(real actualism)를 수반한다. 화이트헤드가 그러한 전통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는 충족이유율(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을 모든 설명의 중심에 놓이는 다른 원리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는 이를 “존재론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실재론적 사유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은 언제나 그 이유의 매개물(vehicle)인 현행적 사실을 찾는 것이며”[26]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들을 찾는 것이다.”[27] 이 원리는 가상적인 것, 가능한 것, 또는 추상화 그 자체와 같은 실재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실존 조건을 표현한다. 각 행위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들과 관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 존재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비존재(non-entity)만 있을 뿐 - 이때 ‘남아있는 건 침묵뿐’ - 이기 때문이다.”[28] 따라서 모든 효과적인 느낌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흉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추상화들의 천상 세계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안에 몸으로(bodily) 새겨져 있다.
*1장 <근대인의 우주론>의 서문, 1장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n-movement.tistory.com/565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서문 & 1장(1/2)
사건으로서의 자연: 가능한 것들의 유혹 저자: 디디에 드베즈(Didier Debaise)영어 번역: 마이클 헤일우드(Michael Halewood)한글 번역: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도서 정보Nature as Event: The Lure of the Poss
en-movement.net
https://en-movement.tistory.com/571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1장(2/2)
사건으로서의 자연: 가능한 것들의 유혹 저자: 디디에 드베즈(Didier Debaise)영어 번역: 마이클 헤일우드(Michael Halewood)한글 번역: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실) *1장 의 후반부입니다.서문과 1장 전반
en-movement.net
각주
*저자가 직접 인용하는 구절들 중 한글 번역본이 있는 경우엔 가능한 한글 번역본을 따라서 번역하려 했으며, 그중 일부 용어나 문구를 다듬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아래 각주에서 *으로 표시한 내용은 드베즈가 인용한 자료의 또 다른 판본의 서지사항 및 페이지 또는 한글 번역본의 서지사항 및 페이지를 적은 역주다.
2장
[1]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ed.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Sherburne, Gifford Lectures of 1927–28, corrected ed. (New York: Free Press, [1929] 1978), 167.
*『과정과 실재』, 오영환 옮김, 2003, 민음사, 347.
[2] William James, Collected Essays and Reviews (New York, Longmans, Green, 1920), 443–44.
[3]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느낌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학과 존재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스티븐 샤비로(Steven Shaviro)의 『기준 없이: 칸트, 화이트헤드, 들뢰즈, 그리고 미학(이문교 옮김, 2024, 갈무리』 (원제 Without Criteria: Kant, Whitehead, Deleuze, and Aesthetics, Cambridge, MA: MIT, 2009)를 참고하라.
[4]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41.
*『과정과 실재』, 121.
[5] René Descartes,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10–11.
*『성찰』, 이현복 옮김, 1997, 문예출판사, 49.
[6]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41.
*『과정과 실재』, 121.
**화이트헤드는 이 문장에 각주를 달아서, 자신의 문장과 유사한 것으로 『성찰』의 제6성찰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유하는 것 res cogitans>를 <파악하는 것 Ens Prehendens>로 대치시켜보라고 말한다.
[7]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176.
*『과정과 실재』, 363-364.
[8] Alfred North Whitehead,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Macmillan, 1927), 42.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문창옥 옮김, 2003, 동과서, 62
[9] George Santayana, Scepticism and Animal Faith: Introduction to a System of Philosophy (Mineola, NY: Dover, 2003).
[10] Whitehead, Symbolism, 42.
*『상징활동』, 62.
[11] Whitehead, Symbolism, 34.
*『상징활동』, 54.
[12] Whitehead, Symbolism, 44.
*『상징활동』, 65.
[13] Gilles Deleuze, The Fold (London: Athlone Press, 1993), 78.
*『주름』, 143-144.
[14] 나는 다른 곳에서 타르드의 저작에 나타난 소유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Mind That Abides: Panpsychism in the New Millennium, (ed. David Skribna, 2008, Amsterdam: John Benjamins, 221–30)에 수록된 Didier Debaise의 “The Dynamics of Possession: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Gabriel Tarde”를 참고하라.
*이 글의 한국어 번역은 「소유의 역학: 가브리엘 타르드의 사회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모나돌로지와 사회학』(가브리엘 타르드 지음, 이상률 옮김, 2015, 이책) 부록Ⅱ에 수록되어 있다.
[15] Gabriel Tarde, Monadology and Sociology (Melbourne, Aus.: re.press, 2012), 54.
*『모나돌로지와 사회학』, 107.
[16] Tarde, Monadology, 52.
*『모나돌로지와 사회학』, 102.
[17] Tarde, Monadology, 54.
*『모나돌로지와 사회학』, 106-107.
[18]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1.
*『과정과 실재』, 83-84.
[19]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1–22.
*『과정과 실재』, 84.
[20]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87.
*『과정과 실재』, 204.
[21] Gottfried Wilhelm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La Salle, IL: Open Court, 1902), 15.
*또는 Leibniz’s Discourse on Metaphysics: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 Christopher Johns, 2023, Edinburgh University Press), 39.
**『형이상학 논고』, 윤선구 옮김, 2010, 아카넷, 52
[22]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14.
*Leibniz’s Discourse on Metaphysics, 38
**『형이상학 논고』, 50.
[23] Leibniz, Discourse on Metaphysics, 14.
*Leibniz’s Discourse on Metaphysics, 38
**『형이상학 논고』, 50.
[24] Deleuze, Fold, 81.
*『주름』, 150.
[25]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26–27.
*『과정과 실재』, 452.
[26]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40.
*『과정과 실재』, 120.
[27]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4.
*『과정과 실재』, 89.
[28]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43.
*『과정과 실재』, 125.
'인-무브 Transl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3장 (0) | 2025.07.23 |
|---|---|
|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2장(3/3) (0) | 2025.07.20 |
|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2장(2/3) (2) | 2025.07.12 |
|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1장(2/2) (0) | 2025.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