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교연의 ‘친구’ 김수환 선생님께서 발레리 포도로가(Valeri Podoroga)의 논문 「혁명적 기계들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문학Revolutionary Machines” and the Literature of Andrei Platonov」 번역을 공개하기 앞서 논문에 얽힌 맥락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흥미롭고도 유익한 소개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플라토노프, 그리고 포도로가의 플라토노프 독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공개된 두브로브니크 세미나에 관한 김수환 선생님의 원고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플라토노프는 1920년대 중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체벤구르>, <코틀로반(구덩이)>등 여러 작품을 집필하며 혁명, 유토피아, 이데올로기, 인간성 등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소비에트의 작가입니다. 이러한 주제적 특성으로 인해 그의 주요 작품들은 소련 당국의 검열을 받으며 생전에 출간되지 못했지만 이후 소비에트-러시아의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포도로가는 격동기의 후기소비에트 지식인 가운데 망명이나 이주를 택하지 않고 러시아에 남아 학문 활동을 지속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2020년에 사망했지만 서구의 철학과 소비에트의 경험에 모두 정통한 그의 후계자들은 현재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좌파계열 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라토노프의 창작 세계는 포도로가와 그의 사단 학자들이 소비에트 시대와 21세기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원천이 되었습니다. 플라토노프의 세계가 소비에트 지식인들의 영감과 논쟁의 한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플라토노프의 세계를 통해 지나간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혹은 힌트를 김수환 선생님의 소개글과 번역문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찾아나가길 기대합니다. - 인-무브 편집팀 |
발레리 포도로가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번역 소개에 부쳐
김수환 | 한국외대
아래에 번역해 소개하는 글은 러시아의 철학자 발레리 포도로가(Valeri Podoroga)의 논문 「혁명적 기계들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문학Revolutionary Machines” and the Literature of Andrei Platonov」이다. 지난 2020년에 사망한 포도로가는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가 가운데 한 명이다. 나는 그와 미국 연구자 수전 벅-모스와의 30여 년에 걸친 우정의 연대기를 되짚어본 지난 게시물(「두브로브니크 강좌(1990)와 수전 벅-모스의 『꿈의 세계와 파국』: 연대에 이르지 못한 우정에 관하여」)에서 이미 그를 소개한 바 있다. 그 글의 말미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필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30여 년 전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격렬한 파국적 순간을 만들었던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작품 세계를 (그의 시각을 경유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두브로브니크 세미나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플라토노프의 소설 『코틀로반(구덩이)Kotlovan』에 대한 집단토론을 제안했는데, 포도로가는 원문으로 읽지 않고는 이 텍스트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당연히 그의 이런 ‘배제적 해석학’은 서구 참여자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파국적 충돌은 극에 달했다.
벅-모스는 스탈린의 급격한 산업화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자연의 기계화’에 관한 물리적 경험이 다름 아닌 플라토노프의 ‘언어’ 속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에는 다만 지나친 민족주의적 편향처럼 보였던 포도로가의 주장에 담긴 전제를 훗날 자신 또한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플라토노프 독해의 문제는 곧 영역본이 출간될 포도로가의 주저 『미메시스』 2권에서도 한 쳅터가 할애되는데, 플라토노프를 중심에 둔 동서의 비교(가령, 제임슨 vs 포도로가)는 극도로 흥미로운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출간예정이라고 언급했던 포도로가의 『미메시스』 2권이 Mimesis: The Literature of the Soviet Avant-garde라는 제목으로 2024년에 버소(verso)에서 출간되었다(1권에 해당하는 Mimesis: The Analytic Anthropology of Literature는 2022년에 먼저 출간되었는데,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벨르이를 다루고 있다). 『미메시스』 2권은 플라토노프를 다룬 1부와 20세기 러시아의 부조리 작가 다닐 하름스Daniil Kharms가 속해 있던 오베리우(Oberiu; Union of Real Art) 그룹을 다룬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번역 소개하는 논문의 내용 일부가 1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권의 영어번역본이 출간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서구의 독자들은 후기 소비에트가 낳은 이 독창적인 사상가의 저작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흥미로운 또 다른 작업이 마침내 가능해졌다는걸 뜻하기도 한다. 그것은 플라토노프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학적 읽기의 작업, ‘제임슨과 포도로가 겹쳐 읽기’라는 과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두브로브니크 세미나 1년 후인 1991년에 르네 웰릭 도서관 비판이론 시리즈 강좌(The Wellek Library Lectures in Critical Theory)1를 맡아 진행했는데, 이때의 강연 원고를 토대로 쓴 책이 바로 『시간의 씨앗들The Seeds of Time』(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이다. “유토피아, 모더니즘 그리고 죽음Utopia, Modernism and Death”이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의 2장 전체는 플라토노프 소설 분석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임슨은 플라토노프를 둘러싼 파국적 충돌 이후 곧장 나름의 플라토노프 읽기에 착수했으며, 이를 자신의 유토피아론의 핵심적 원천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포도로가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가 플라토노프에 관한 본격적인 글을 ‘모국어’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다. 그가 출판한 최초의 플라토노프 관련 정식 논문은 1991년에 학술지 South Atlantic Quarterly에 실은 「영혼의 내시: 독해의 입장들과 플라토노프의 세계The Eunuch of the Soul: Positions of Reading and the World of Platonov」(Vol. 90. 2, 1991, 357–408)인데, 페레스트로이카를 특집으로 다룬 해당 호의 책임 편집자가 바로 제임슨이었다. 틀림없이 벅-모스와 제임슨의 강권에 의해 번역 게재되었을 포도로가의 이 글이 얼마 후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서 진행했던 제임슨의 비판이론 강좌에 강한 동기부여가 됐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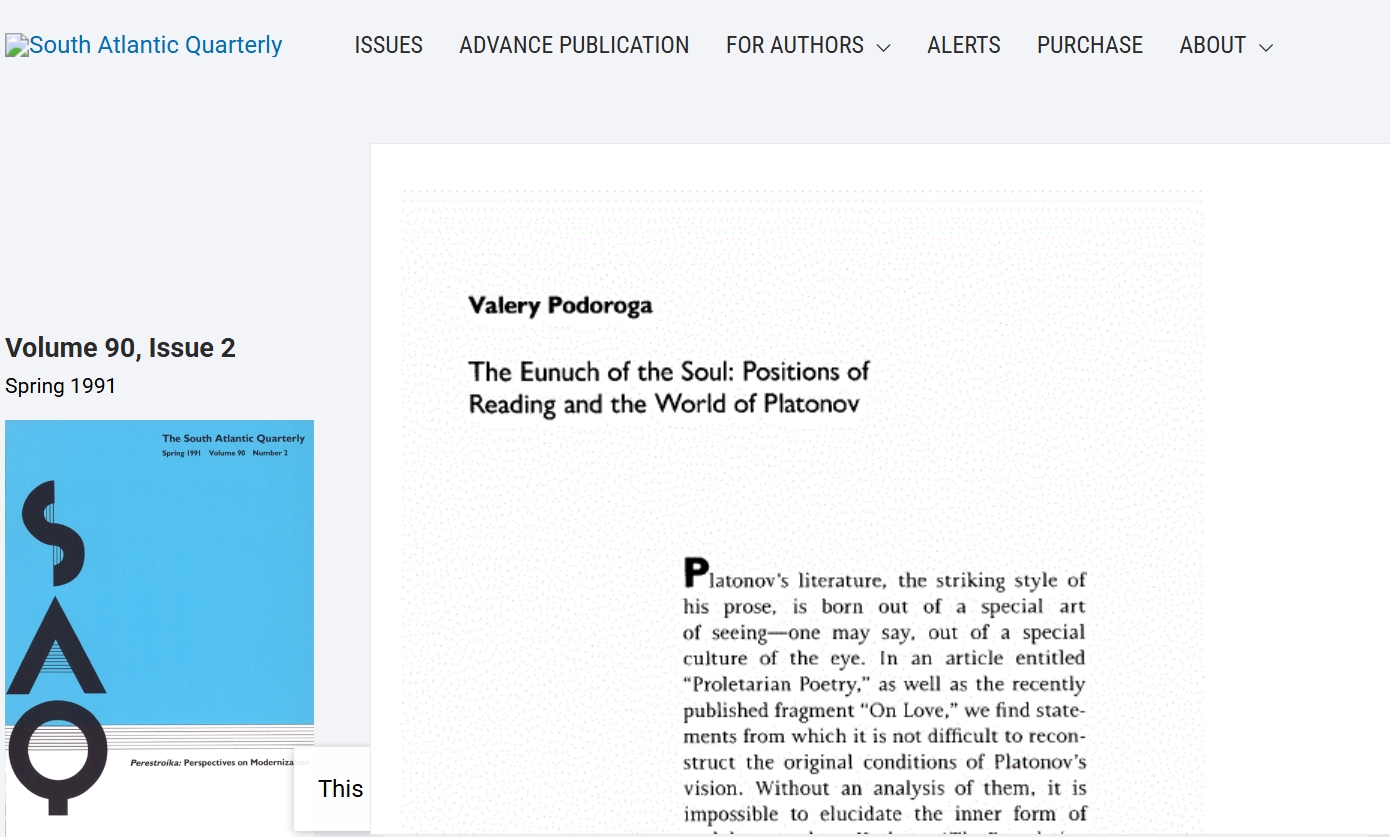
영어로 쓴 이 글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플라토노프의 문학, 그의 산문의 충격적인 스타일은 보기의 특별한 예술(special art of seeing), 이를테면 특별한 눈의 문화(culture of the eye)로부터 태어났다.” 소비에트의 칸트 및 후설 권위자였던 메랍 마마르다슈빌리를 계승한 이미지와 지각의 현상학에서 출발해, 신체와 권력, 사물과 기호의 탈구축적 동학을 둘러싼 다각도의 탐색(주로 푸코, 들뢰즈, 데리다에 기댄)을 거쳐, 결국 급진적으로 재구성된 “미메시스”와 “분석적(analytic) 인류학” 개념으로 집약된 바 있는 포도로가의 사상적 여정을 이 자리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30년 넘게 이어진 그의 학문적 여정 전체에서 철학적 탐구의 물길을 대는 변함없는 수원(水源)이자 계속된 실험과 적용의 대상으로 작용해온 것이 다름 아닌 플라토노프의 창작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메시스』 1권의 부제이기도 한 “문학의 분석적 인류학”이란 문학 작품의 에너지와 힘에 독자가 ‘감각적’이고 ‘신체적’으로 사로잡히는 과정을 밝혀내고, 그 체험의 고유한 리듬과 패턴을 추적/재구성하는 작업을 가리키는데, 사상의 후반기에 정식화될 이 독특한 개념의 개요는 앞선 글 「영혼의 내시: 독해의 입장들과 플라토노프의 세계」에서 이미 고스란히 표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플라토노프는 ‘제임슨과 포도로가의 비교학적 읽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포도로가의 사상 자체의 핵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중핵에 해당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포도로가와 플라토노프’라는 토픽과 관련해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맥락이 존재한다. 이제껏 국내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이 맥락은 이른바 포스트소비에트 좌파 연구의 새로운 세대와 관련된 것이다. 포도로가는 후기소비에트 지식인 그룹 중 거의 유일하게 망명과 이주를 선택하지 않고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서 학문 활동을 지속했던 인물이다(보리스 그로이스와 스베틀라나 보임은 1980년대 초반에, 미하일 얌폴스키와 알렉세이 유르착은 1990년대에 서방에 정착했으며, 유리 로트만과 함께 활동했던 모스크바-타르투 학파 참여자 거의 대부분, 그리고 유리 치비안, 미하일 엡슈테인, 예브게니 도브렌코 같은 학자들도 독일과 미국 등지의 대학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국가기관(러시아 학술원 산하 철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로 평생 재직하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포도로가의 ‘예외적’ 행보는,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적 캐릭터와 더불어 포스트소비에트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를 둘러싼 특별한 컬트적 아우라를 부여했던 바, 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낳았다.
현재 러시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좌파 계열 학자들 중 상당수는 포도로가 사단의 후계자들로, 이들은 포도로가를 자신들의 유일무이한 사상적 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면면과 활동을 대략이나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페테르부르크 유럽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아르테미 마군(Artemy Magun)이 있다.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과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정치학과 철학으로 학위를 받은 마군은 2013년에 사회정치철학 저널 Stasis를 창간해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저널은 과거 포도로가 사단의 일원이었던 엘레나 페트롭스카야가 창간했던 저널 <푸른 소파>가 했던 역할, 동시대 서구 철학과 이론을 러시아에 전파하고 그 역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영어로 번역 출간된 두 권의 뛰어난 저서(Negative Revolution: Modern Political Subject and its Fate After the Cold War, Bloomsbury, 2013; Temptation of Non-Being, Bloomsbury, 2024) 이외에도 현대 정치철학 및 예술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두 번째로 옥사나 티모페예바(Oxana Timofeeva)가 있다. 포도로가의 지도제자로서 애초 조르쥬 바타유 전공자로 출발했던 그녀는 인류학(동물학)과 우주론(태양 정치학)을 아우르는 폭력과 섹슈얼리티 관련 저작들을 연이어 출간하면서, 현대 정치철학 분야에서 눈에 띠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도 이후 출간된 책으로 The History of Animals: A Philosophy (Bloomsbery, 2018), Solar Politics (Polity, 2022), Freud’s Beasty Boys: Sex, Violence and Masculinity (Matthes & Seitz Berlin, Polity, 2025) 등이 있는데, 이미 다수의 외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마군과 티모페예바 두 사람이 2003년 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된 예술·철학·비평 집단 “슈토 델라치(chto delat)”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작가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 제목이자 레닌이 발행했던 정치 팜플렛의 명칭이기도 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타이틀로 삼은 이 콜렉티브는 소비에트 해체 이후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페테르부르크 재건’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인 젊은 연구자, 예술가, 비평가들의 조직으로 출범했다. 슈토 델라티는 지난 20여 년간 다각도의 출판, 예술 프로젝트, 전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왔으며(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 현재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가 하면, 주로 21세기 러시아 미디어 이론 분야에서 작업해온 올레그 아론손(Oleg Aronson)[<자음과 모음> 2009년 봄 호에 최진석의 번역으로 그의 글이 소개된 바 있다]은 포도로가 사단의 막내 격에 해당하며, 2010년 이후로 구축주의와 생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아방가드 연구를 혁신해 온 케티 추흐로프(Keti Chukhov)와 이고르 추바로프(Igor Chubarov), 그리고 보리스 아르바토프 영역자이자 "슈토 델라티"의 창립 멤버로 주로 소비에트 맥락에서의 마르크스주의 미학에 천착해온 알레세이 펜진(Alexei Penzin) 등이 넓은 의미의 포도로가 제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사실만 보더라도 21세기 소비에트 좌파 연구 진영에서 포도로가가 점하는 위상과 무게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이라면 첫째, 20세기 서구의 철학과 이론에 해박하다는 점, 둘째,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지탱하는 다른 한 축으로 (19세기 전통적 러시아 사상이 아닌) 소비에트의 경험과 철학을 내세운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소비에트 작가이자 21세기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플라토노프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나는 20세기의 중대한 증언자일 뿐만 아니라(알다시피 지젝은 베케트, 카프카와 함께 플라토노프를 “20세기의 절대 작가 3인”으로 추켜세운 바 있다) 21세기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서 플라토노프의 세계를 다시 사유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번역 소개하는 포도로가의 논문이 이 작업의 개시를 알리고, 한국 독자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981년에 시작된 이 강좌 시리즈의 강연자들로 프레드릭 제임슨(1991), 볼프강 이저(1994), 로잘린드 크라우스(1995), 에티엔 발라바르(1996), 주디스 버틀러(1998), 장 보드리야르(1999), 가야트리 스피박(2000), 호미 바바(2001), 데이비드 하비(2005), 조엔 스콧(2008), 도나 해러웨이(2011), 브뤼노 라투르(2012), 피터 슬로터다이크(2013), 티모시 모턴(2014), 케더린 헤일즈(2016), 웬디 브라운(2018) 등이 있다. [본문으로]
'인-무브 Translation > In Moving Transl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혁명적 기계들”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문학 (3부, 끝) (0) | 2025.08.15 |
|---|---|
| 영어의 아시아적 양식들에 대하여 (On the Asiatic Modes of English) (2) | 2025.08.13 |
| “혁명적 기계들”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문학 (2부) (8) | 2025.08.05 |
| “혁명적 기계들”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문학 (1부) (5) | 2025.07.20 |
| 디디에 드베즈, <사건으로서의 자연> 서문 & 1장(1/2) (0) | 2025.05.11 |
| 사변적 경험주의, 자연 그리고 포식적 추상화에 관한 물음: 디디에 드베즈와의 대화 (0) | 2025.04.29 |
| 자연을 넘어서: 개념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이 되었는가 (0) | 2025.03.08 |
| 짐 배곳(Jim Baggott): 양자 변증법(Quantum Dialectics): 마르크스주의와 양자역학의 마주침 (0) | 2025.01.01 |



